입력2006.04.02 07:21
수정2006.04.02 07:23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이 급격한 엔저(低) 여파로 급등하고 있지만 외환당국은 엔화 약세를 무리 없이 반영하는 '시장 자율조정'으로 보고 있다.
국내 외환시장 수급에 별다른 이상이 없어 당장 환율 급등에 대해 개입하거나 우려의 메시지를 던지기엔 이르다는 것이다.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은 지난달 말보다 3.4% 절하됐다.
1천2백73원이던 것이 1천3백10원대로 올랐다.
대만 달러화가 1.6% 절하에 그친데 비하면 원화의 '엔화 따라가기'는 비교적 무난한 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일본 중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 5개 경쟁국의 환율과 비교한 실효환율(NEERI)이 지난 21일 현재 1천3백11원20전이었다.
실제 환율이 1천3백8원90전이므로 원화 움직임은 경쟁국 통화 변동에 적절히 맞춰 가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환율 면에서 수출경쟁력은 아직 '큰 무리가 없다'는 진단이다.
원.엔화 환율은 여전히 1백엔당 1천10원 안팎에서 등락을 거듭중이다.
엔화가 오른 만큼 원화도 덩달아 올랐기 때문이다.
한국투신증권은 26일 "원화의 엔화 동조화에 따른 국내 산업영향이 아직까진 중립적"이라고 분석했다.
원화환율 전망은 엔화 약세가 어디서 멈추느냐에 달려 있다.
일단 1백30엔을 넘긴 이상 1백35엔까지는 열려 있다고 보는 분위기다.
한은 관계자는 "일본은행(BOJ)은 내년초에 엔화가 좀더 오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1백35엔 아래에서 유지될 전망"이라며 "원화 환율도 1천3백50원 위로 고공 비행할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다.
결국 원화가 언제까지 엔화를 따라갈 것이냐가 문제다.
경제.금융 여건상 엔화 약세가 불가피한 반면 원화는 강세 요인이 더 많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10 대 1'이란 원.엔화 황금률이 깨지게 돼 수출경쟁력 유지대책을 새로 짜야 한다.
오형규 기자 ohk@hankyung.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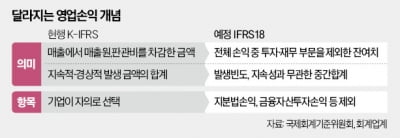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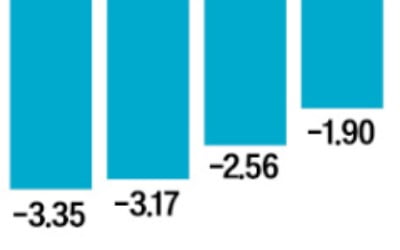











![르세라핌, 美서 라이브 '대참사'…'K팝 아이돌' 논란 터졌다 [이슈+]](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01.36438208.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