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04:01
수정2006.04.02 04:03
아메리칸 인터내셔날 그룹(AIG)이 현대증권 인수에 또 다른 조건을 요구,인수협상이 다시 난항에 빠진 것은 이미 예고된 결과라는게 증권업계의 분석이다.
정부는 AIG와 현투증권 현대투신운용 현대증권의 매각협상을 시작할 때부터 일방적으로 끌려 가는 입장에 처해 있었던데다 마치 양파껍질 벗기듯 자꾸만 새롭게 제기되는 AIG의 요구조건을 결과적으로 모두 수용한 때문이다.
이런 까닭에 AIG는 일단 MOU(양해각서)를 체결한뒤 자신들이 갖고 있는 요구조건을 관철하려 들 것으로 예상돼 왔었다.
AIG가 이번에 요구한 인수조건의 핵심은 배당률(액면가 기준)을 당초 5%에서 7%로 올려 달라는 것이다.
AIG는 당초 컨소시엄을 구성할때 내부적으로 연7%수준의 수익률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맞추기 위해 배당률을 5%로 하향조정하는 대신 현대증권 우선주의 발행가격을 8천9백40원에서 7천원으로 낮춰 이를 관철시켰다.
그러나 컨소시엄내부에서 다시 이론이 제기되자 이번엔 아예 배당률을 올려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증권업계에서는 그러나 AIG의 요구는 미국의 관행에 비춰봐서도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AIG는 자신들이 약속한 배당률 5%는 액면가(주당 5천원)가 아닌 발행가(주당 7천원)를 기준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무액면주가 많아 배당률이란 개념은 거의 없다.
대신 주당 배당금이 통용된다.
이를 감안하면 AIG측이 자신들의 무리한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둘러대기라고 볼수 밖에 없다고 증권업계에서는 해석하고 있다.
더욱 관심을 끄는 것은 AIG의 투자의도다.
1년이 지나면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해주고 현대증권의 경영이 악화될 경우 원금보장을 약속하라는 요구는 경영권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투자수익만 올리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런 식이라면 AIG가 현투증권을 인수하더라도 경영정상화를 이룰 것으로 장담할 수 없다.
증권 투신업계가 더 이상 AIG에 끌려다녀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하영춘 기자 hayoung@hankyung.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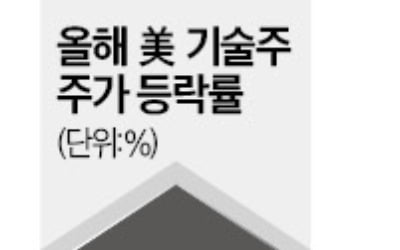











![[오늘의 arte] 독자 리뷰 : 당신의 미술 취향은 무엇인가요](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AA.36523699.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