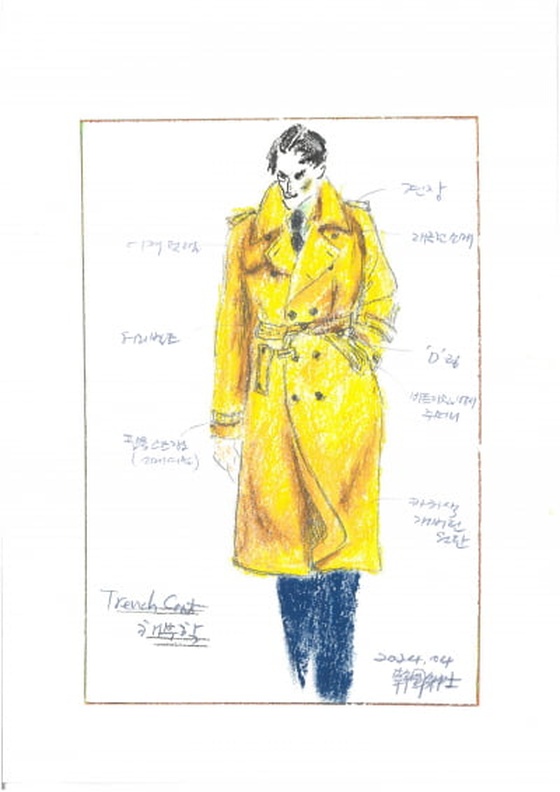입력2006.04.01 22:57
수정2006.04.01 23:00
세계 증시를 짓누르는 다섯가지 위기설이 나돌고 있다.
첫번째가 지난주부터 미국과 유럽 증시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기술주 폭락설이다.
이번주부터 2.4분기 미국 첨단기술 회사들의 실적 발표가 줄을 잇고 있어 당분간 지속적으로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2.4분기 실적은 이미 실현된 실적인 데다 첨단기술주의 거품이 어느 정도 해소된 상태이기 때문에 기술주 폭락설이 구체화될 가능성은 비교적 낮다는 것이 월가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시각이라는 점이다.
두번째로 거론되는 것이 엔화 가치 폭락설과 아시아 통화 가치의 동반 하락설이다.
이는 일본 경기의 장기 침체에다 엔화 가치의 천수답(天水畓) 수출구조를 갖고 있는 아시아 경제의 특성에서 비롯되고 있다.
앞으로 예상되는 미.일간의 경제여건만 따진다면 엔화 가치가 달러당 1백30엔 이상으로 폭락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그러나 무역적자와 일본내 자금이탈에 따른 추가 경기침체 부담이 있는 미국과 일본경제 입장으로서는 지나친 '달러화 강세-엔화 약세'를 수용하기 어렵다.
설령 엔화 가치가 1백30엔 이상으로 떨어진다 하더라도 아시아 국가들이 외화 유동성을 많이 확보한 점을 감안하면 지난 97년 당시처럼 외환위기에 몰릴 가능성은 희박하다.
오히려 영국의 유력 경제지인 이코노미스트가 제기한 정보기술(IT) 산업 위기설이 아시아 경제에는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게 세번째 악재로 꼽힌다.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은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대미 수출비중이 주로 IT 부문에 의해 높아졌다.
이 상황에서 미국 IT분야 추가 재고조정이 이뤄질 경우 아시아 경기는 다시 둔화될 것이라고 이코노미스트는 지적하고 있다.
네번째 악재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나돌고 있는 외환위기 3년 주기설이다.
지난 주말 중남미 경제의 불안감이 고조되면서 재차 거론되고 있다.
다섯번째로 각국간 국제수지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 꼽힌다.
불균형 정도를 따진다면 1985년 9월 플라자합의 당시보다 심하다.
통상 외환위기와 국제수지 불균형문제 해결은 국제통화기금(IMF)과 선진국들간의 긴밀한 협조체제하에 얼마나 신속하게 대응하느냐가 관건이다.
최근 IMF의 재원이 부족하고 경제이기주의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문제 해결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한상춘 전문위원 schan@hankyung.com
!["1400원 과했다"…한·미·일 재무장관 나서자 환율 13.9원 뚝 [한경 외환시장 워치]](https://img.hankyung.com/photo/202404/ZA.36452130.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