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이대론 안된다] (3) '시장관리'가 없다
이날 주총을 연 코스닥기업은 1백42개사나 됐지만 이날 공시를 낸 곳은 이중 70%를 갓 넘은 1백2개사 뿐이었다.
31개사는 휴장일(토요일)인 다음날 공시를 냈고 아예 9개사는 주말을 넘겨 19일에야 주총결과를 알렸다.
같은 날 주총을 열었던 거래소 상장기업 2백19개사가 예외없이 당일에 모두 공시를 낸 것과는 극명하게 대조됐다.
당시는 ''IT(정보기술)주 거품론''이 한창일 때라 투자자들은 애간장을 태워야 했다.
''코스닥답다''는 자조적인 평가가 뒤따른 것은 어쩌면 당연했다.
''시장관리 부재''는 코스닥시장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의 하나로 지목된다.
지난 3월의 무더기 지각공시는 이를 잘 보여준다.
물론 공시 시한은 거래일 기준으로 다음날까지로 돼있다.
금요일에 주총을 열었다면 월요일에 공시해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는 얘기다.
그렇지만 주총에 참석한 투자자와 그렇지 않은 투자자간에는 엄청난 정보의 불균형이 생긴다.
시장관리시스템의 하나인 공시제도가 힘을 발휘하지 못해 생기는 현상이다.
그런데도 시장관리자나 감독당국은 팔짱을 끼고 있다.
오히려 서로간에 책임을 미루며 핑퐁을 친다.
"법개정 사항이어서 손을 쓰기 힘들다.
공시를 빨리 하라고 기업들을 독려할 뿐이다(코스닥증권시장)" "보고받지 않아 실상을 잘 모른다(코스닥위원회)" "거래소시장과의 형평때문에 법개정은 힘들다(금융감독원)"는 것이다.
대우증권 투자정보부 홍성국 부장은 "코스닥기업은 규모도 작고 틈새시장을 겨냥한 곳이 많아 정보를 접하기가 쉽지 않다"며 "주총결과 등의 공시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등록기업들의 불성실공시도 투자자의 불신을 사는 요인이다.
올들어 18일 현재까지 불성실공시는 모두 38건.제때 공시하지 않았다가 사후에 적발된 것만도 13건에 이른다.
불성실공시 2회로 투자유의종목에 지정된 업체도 현재 6개사나 된다.
코스닥시장에서는 공시를 믿기 힘들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제때 공시되지 않은 기업정보는 내부자거래나 시세조정에 이용될 소지가 많은 만큼 이를 유기적으로 감시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명변경과 액면분할·병합이 유행처럼 계속되고 있는 것도 투자자를 헷갈리게 만드는 요인이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이름을 바꾼 곳은 무려 85개사로 횟수로는 89번이나 된다.
특히 이들 중에는 행여 주가에 도움이 될까 하고 벤처나 IT업체처럼 사명을 바꾼 곳이 수두룩하다.
시장관리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다.
코스닥기업은 공시담당자가 대부분 1명이다.
IR팀까지 운영하는 상장기업과는 거리가 멀다.
증권사의 애널리스트가 적다는 것도 보완할 점이다.
LG투자증권 박종현 팀장은 "규모가 작은 코스닥기업에 대해서는 담당 애널리스트가 없다"며 "애널리스트 부족→기업 분석자료 미흡→회사측 정보 의존이란 악순환을 끊지 않으면 주가가 왜곡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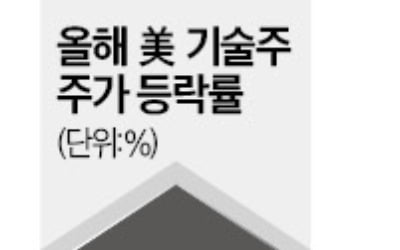











![[오늘의 arte] 독자 리뷰 : 당신의 미술 취향은 무엇인가요](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AA.36523699.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