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시장] 기준가격 상하 25% 가이드라인 정해 .. '금감원 대응책'
그동안 유가증권신고서(공모 신고) 심사과정에서 금감원의 잣대가 일정한 원칙 없이 담당자별로 자의적인 기준을 적용해 왔다는 업계의 비판을 수용한 것이다.
증권사들은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할 때 본질가치의 5~10배에 달하는 터무니없는 가격을 공모희망가격으로 제시한 기업도 많았다고 주장해 왔다.
금감원은 심사의 객관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공시심사 업무처리지침(가이드라인)을 정했다.
본질가치와 상대가치 및 사업성을 고려해 기준가격을 계산하고 그 기준가격의 상하 25% 이내에서 공모희망가격을 제출하면 심사과정을 거치지 않고 최종승인을 내주기로 했다.
공모희망가격 뿐만 아니라 상장(등록)후 예상주가도 문제다.
증권사들이 예상주가 또는 적정주가를 높게 공표함으로써 일반투자자의 투자판단에 혼선을 빚어 왔다는 것이 금감원의 인식이다.
이는 더 나아가 불공정거래의 책임문제까지 불러 일으킬 수 있다고 금감원은 보고 있다.
미국의 경우 주식공모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기간(나스닥 용어로 blackout period)에는 상장.등록후 예상주가를 발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금감원은 주간사 증권사가 실사결과를 공모희망가격으로 표현해야지 상장(등록)후 예상주가까지 발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막상 예상주가 발표를 지양하라고 권고할 뿐 제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윤승한 금융감독원 공시심사실장은 "예상주가의 발표금지를 강제규정으로 두는 것은 규제완화에 역행된다"며 "예정주가를 높게 발표함으로써 불공정거래를 했다는 혐의가 포착되면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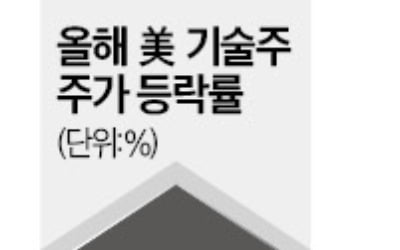











![[오늘의 arte] 독자 리뷰 : 당신의 미술 취향은 무엇인가요](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AA.36523699.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