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상장 20여개사 그칠듯 .. 제3시장 잰걸음...앞으로 어떻게
상장신청을 하면 증권업협회는 5일동안 심사를 거쳐 상장허가 결정한다.
다시 3일이 지나면 주식거래가 가능하게 돼 있다.
토.일요일을 빼고 신청접수부터 주식거래까지 8일이 소요된다.
이 스케줄 대로 역산해 들어가면 오는 30일부터는 제3시장에서 주식매매가 가능해진다.
따라서 공식적으로 발표는 하지않았지만 제3시장은 30일께 문을 열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7일까지 증권사들의 제3시장 주식매매 시스템을 실사했다.
일차 매매창구가 증권사인 만큼 증권사 전산시스템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시스템 수준이 시장운영에 지장이 없는 지에 대한 최종 판단만 남겨 놓은 상태다.
금감원이 OK사인을 내면 시장 개장일정도 곧바로 확정돼 발표될 예정이다.
<>기업등록은 제3시장 상장의 전제=상장신청을 하려면 금융감독위원회에 기업등록부터 마쳐야 한다.
사모한 지 1년이 안됐더라도 모집한 금액이 10억원 미만인 업체는 금감위 등록 후 곧바로 상장을 신청할 수 있다.
과거 모집.매출때 규모가 10억원을 넘는데도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제3시장에 상장할 수없다.
부분 상장도 가능하다.
이 경우 상장요건은 조금 복잡해 진다.
먼저 주식매도를 희망하는 주주를 지정하며 이때 매도 예상금액 합계가 10억원을 넘으면 해당기업은 유가증권신고서를 내야 한다.
또 주주가 개별적으로 주식을 매도하려면 증권회사를 통해 상장을 신청해 승인 받을 수 있다.
결국 기업이 아닌 주식을 상장하는 형태가 되는 셈이다.
다만 개별 상장신청 때도 매도 합계액이 10억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면 주주는 해당기업에 요청해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과 증협은 현행 거래법상 주식 매도금액이 10억원을 넘을때 마다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토록 돼 있어 제3시장 참가자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따라 기재내용과 양식 등을 대폭 간소화한 유가증권신고서를 새로 도입해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개장때 참가기업은 20개 미만=코스닥증권시장 에 따르면 제3시장 상장의향서를 제출한 기업은 모두 2백48사에 달한다.
의향서 제출 기업이 이처럼 많은 데는 요건이 까다롭지 않은 제3시장을 통해 코스닥시장이나 거래소시장으로 진출하자는 의도가 깔려있다.
제3시장내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제3시장 상장요건을 까다롭게 만들기 이전에 신청이 이뤄진 것들이 대부분이다.
코스닥증권시장 관계자는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이나 양도세 부과 등을 감안하지 않은 사례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따라서 탈락하거나 스스로 상장을 취소하는 기업들도 적지 않게 생겨날 전망이다.
개장때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은 훨씬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공모 업체들을 포함해 유가증권신고서를 내야 하는 곳이 적지 않다.
게다가 주식 예상 매도금액이 10억원 이상이 될지 가늠하기도 쉽지 않다.
예상 매도금액을 파악하기 힘든 업체로선 유가증권신고서를 먼저 제출해야 된다.
유가증권신고서는 1억원 가량의 비용과 적지않은 작성기간을 필요로 해 문을 열때 참여하는 기업숫자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코스닥증권시장 측은 "개장때 참여 가능한 업체는 20개 미만일 것"이라며 "그러나 4월 중순이후엔 참여업체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투자자 오도 사례는 엄격 제재=제3시장 진출을 위해 인터넷 공모를 하는 업체들은 몸조심을 해야한다.
증권업협회는 인터넷공모로 투자자를 현혹시키는 기업들은 불이익을 준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인터넷공모업체가 인터넷상에 "제3시장 상장신청 접수 업체"라고 표기했다고 치자.이러면 투자자들은 제3시장에서 주식거래가 되는 업체인줄로 잘못 인식할 공산이 크다.
바로 투자자들을 오도시키는 사례다.
이런 업체에 대해선 제3시장 상장신청때 상장과 거래시점을 대폭 지연시키는 형태로 제재한다는 게 증협의 계획이다.
증협 관계자는 "투자자를 오도해 자금을 모으는 업체는 제재할 방침"이라며 "그러나 투자자들도 상장신청한 모든 기업이 제3시장에서 주식거래가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기호 기자 khpark@ked.co.kr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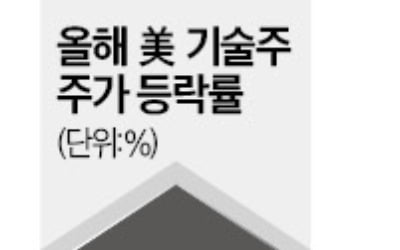











![[오늘의 arte] 독자 리뷰 : 당신의 미술 취향은 무엇인가요](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AA.36523699.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