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안정기금 개입] '채권기금 문제없나'
위력을 발휘했지만 기금의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여전히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우선 기금이 부실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다.
기금은 채권을 매입하되 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회사채를 사들인다는
방침이다.
30대그룹 계열사들이 발행한 채권이 주요 대상이다.
BB(투자부적격)이하 채권들은 매입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따라서 이들 채권 금리는 지금보다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은행 보험 등 기관입장에선 기금이 사주지 않는 채권에 투자할리 없다.
우량채권과 불량채권간 금리차가 더 크게 벌어지는 금리양극화 현상이
예상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우량채권만 사주게되면 투신사 공사채형 수익증권에는 불량채권만 남는다.
부실자산만 있는 펀드에 돈을 계속 맡겨둘 고객은 없을 것이다.
더 큰 규모의 환매사태가 생기지 말라는 법도 없다.
채권기금이 지난 90년 증시를 살리기위해 만들었다 부실화된 증시안정기금
의 재판이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는 그래서 나온다.
정부가 의도대로 시장을 끌고가기 위해 기금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간섭할 소지가 큰 것이다.
기금 자체가 정부작품이기 때문이다.
자칫하면 회사채 매입기준도 흐지부지될 수 있다.
이같은 걱정 때문에 외환 국민 주택 하나 한미은행 등의 외국계 주주들은
매입채권에 대해 정부가 보증을 서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조원짜리의 대형펀드가 부실화되면 은행마저도 동반부실화될 것이란
걱정이 깔려 있는 것이다.
무리한 금리내리기가 후유증을 낳을 소지도 있다.
적정금리는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게 바람직하다.
그러나 지금은 정부가 아예 적정금리를 정해 놓았다.
정부는 한자릿수 금리가 적정하다고 보고 있다.
시장에서도 그같은 생각을 하는 참여자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적정금리가 연 11%를 넘는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폭락은 폭등을 부른다"는 말이 있듯이 물량공백속에 나타난 금리폭락은
시장구조를 왜곡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금리 선순환이 나타나는게 아니라 악순환이 생길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 이성태 기자 steel@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28일자 ).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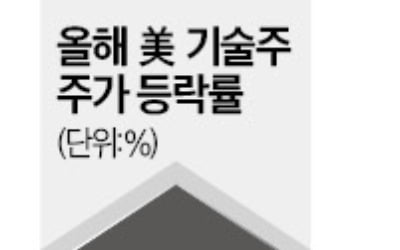











![[오늘의 arte] 독자 리뷰 : 당신의 미술 취향은 무엇인가요](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AA.36523699.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