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여록] 외제주가
주식시장이 자생력을 잃고 외국인의 일거수 일투족에 따라 주가가
오르내리는 상황을 빗댄 신조어이다.
외국인 투자 한도확대가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주식은 곤두박질을
치고 있다.
단지 외국인의 "관심"만으로 주가가 폭등하고 급락하고 잇는 것이다.
이런 외제주가의 뿌리는 두말할 것도 없이 "관제"주가다.
정부는 그동안 주가가 오른다 싶으면 국민주다 공기업민영화다 해서
물량을 쏟아부었다.
바닥도 모른채 떨어지면 순매수우위원칙이니 금융기관증자 및 공개
금지라는 "초법적"수단을 꺼리낌없이 휘둘렀다.
고비고비마다 외국인한도확대가 약방의 감초처럼 끼어든 것은 물론이다.
냉탕온탕식 땜질처방은 결국 증시를 멍들게 했다.
합리적인 주가분석보다는 정책에 대한 정보전쟁이 더 확실한 투자
기법이 됐고 이른바 "작전"이 판치게 됐다.
"애"는 식고 "증"만 키워온 개인투자자들은 증시에 등을 돌렸다.
기관투자가들도 코앞의 돈벌이에만 눈멀어 장기적인 증시발전은
뒷전이었다.
지난 1~8월중 개인과 기관이 2조8,000억원어치의 주식을 팔아치웠다.
그 공백을 외국인(2조3,000억원)이 메웠다.
올들어 경기둔화 기업실적악화 무역적자확대 금리고공행진 기업총수
실형선고 등 증시를 짓누르는 악재가 잇따르면서 주가가 맥없이 무너지자
개인과 기관은 떠나고 외국인만 시장을 지킨 셈이다.
외국인이 없으면 증시가 문을 닫아야 할 판이다.
정부는 이번 한도확대 발표로를 해놓고 한숨돌리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증시에서도 8월말의 극단적 비관론을 찾아보기 힘들다.
모두 들떠 있는 하루살이같다.
"증시살리기"는 어느덧 잊혀져가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은 언제라도 썰물처럼 빠져나갈 수 있는 시한폭탄이다.
이런 점에서 관제 주가원 외제주가는 진작 벗었어야 하는 구시대
유산임에 틀림없다.
합리적인 시세를 찾아나서는 장정에 나서야 할 때라는 말이다.
홍찬선 < 증권부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7일자).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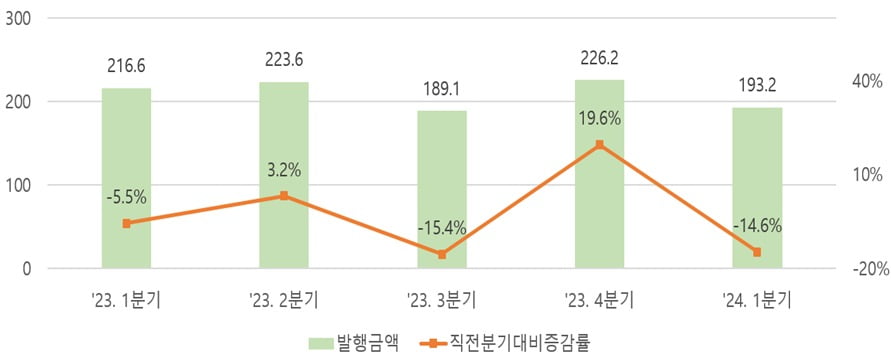


![넷플릭스, 가입자 순증 꺾였다…악재 쏟아진 기술주 [글로벌마켓 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B2024041907203332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