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첫 빌보드차트 7위 진입… 방탄소년단의 '스토리 파워'
자체제작 영상 급속 확산
팬들과 직접 SNS 소통
K팝 역사 새로 쓴 보이그룹
중소기획사 빅히트엔터 소속
스토리텔링형 7인조 아이돌
'소셜 50'에서도 50주째 1위
1020 매혹시킨 인기 비결
멤버들이 직접 작사·작곡
자신의 이야기를 노래로 청소년 세대와 소통 이끌어

방탄소년단은 자본과 해외 네트워크가 탄탄한 국내 3대 주요 기획사(SM, YG, JYP) 소속이 아니다. 이들의 모태는 음반제작자 방시혁이 이끄는 빅히트엔터테인먼트다. 외국인을 겨냥한 영어 노래 하나 없고 해외에 특별한 프로모션도 하지 않는다. 이런 방탄소년단이 국내를 넘어 해외까지 영향력을 넓힌 비결에 문화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20세대 사로잡은 ‘스토리 파워’


빌보드는 지난해 10월 ‘방탄소년단은 어떻게 미국 K팝 차트 기록을 세웠나’란 제목의 칼럼에서 “정신적인 고뇌, 아이돌로서의 삶, 여성을 응원하는 노래까지 한국 문화에서 잘 다루지 않는 독특한 주제를 다뤘다”며 “방탄소년단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하다”고 했다.
◆SNS 통한 소탈한 소통이 통했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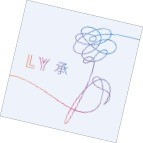
트위터도 활발하게 썼다. 자기 얼굴을 찍은 셀카 사진을 적극적으로 올리고, 방송 출연 소감이나 뒷이야기 등을 남겼다. 멤버들이 트위터에 올리는 콘텐츠는 세련되게 잘 제작된 공식 홍보용 콘텐츠가 아니라 자잘하고 평범한 일상의 단면이다.
지난 9일 올라온 트윗이 대표적이다. 멤버들은 ‘방탄멤버방’이란 이름으로 멤버 7명이 함께하는 단체 채팅방을 캡처한 사진을 공개했다. “내가 어제 모기를 다 죽이고 잤는데 왜 웽웽대지” 같은 일상의 소탈한 대화가 있는 그대로 담겨 있다. 팬들은 방탄소년단의 콘텐츠를 거의 실시간으로 번역해 온라인에서 공유하면서 해외에 퍼뜨린다.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측은 “세계인이 방탄소년단 음악에 환호하는 건 선명한 메시지를 담은 주체적인 콘텐츠와 진정성있는 소통 덕분”이라며 “방탄소년단은 뮤지션이 가까이 다가가야 할 대상이 해외 에이전시나 미디어 등이 아니라 음악팬들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했다.
마지혜 기자 looky@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기업실적 호조에 일제히 상승…테슬라는 최대폭 매출 감소[뉴욕증시 브리핑]](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ZA.36457219.1.jpg)


![[단독]하이브 키운 '멀티 레이블'이 제 발등 찍었다](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02.33877838.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