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준수 '스크린 에세이'] '징기스칸' .. 용장을 덕장 모습으로
그래서 서양인이 칭기즈칸을 보는 시선은 곱지 않다.
그런 자존심 손상을 여실히 드러낸 서양영화가 1956년 제작된 "정복자 (The Conqueror) "다.
존 웨인이 칭기즈칸으로 나오는 이 영화는 주인공을 잔혹한 침략자로 묘사해 막판엔 비참한 죽음에 이르도록 한다.
동양이 배출한 최고의 전쟁영웅이 음모의 칼에 허무한 죽음을 당하는 순간,환호의 박수를 보내는 관객태도에 매우 분개한 기억이 있다.
동서양을 걸쳐 대제국을 건설한 칭기즈칸을 제대로 영화에 담기 위해선 웅대한 스펙터클이 필요하다.
당연히 할리우드가 선수를 칠 만 했으나 문제는 멋대로(?)"일그러진 영웅"처럼 그려놓은 것.
아무리 세계화 시대라지만 같은 황인종으로서 비위가 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이번엔 아시아에서,그것도 본고장인 몽골에서 그 영화를 만들었다니 기대가 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그의 인간상이 어떻게 그려졌을지 궁금했다.
적어도 할리우드 작품처럼 "죽어 마땅한"인물로 묘사되지는 않았으리라 싶었다.
예상은 적중했지만 위대한 조상을 받드는 자세가 너무 소극적이라서 적이 실망했다.
몽골판 "징기스칸"의 주인공은 정복자의 모습이 아니라 사랑의 사도처럼 보인다.
처음엔 냉혹한 무골이었으나 세력이 커지면서 자비로운 지도자로 바뀐다.
자신을 위기로 몰아넣은 배신자를 용서하는가 하면,적군의 아이를 밴 애인을 받아들이고 그 자식을 키우는 아량까지 보인다.
김수환 추기경이 이 영화를 보고 추천까지 했다니 주인공의 휴머니즘이 어느정도인지 알만하다.
역사에 기록된 성길사한의 모습은 이게 아닌데...
아무리 현대적인 해석을 한다 해도 한 시대를 풍미한 전쟁영웅을 성인군자로 만들다니 납득이 안된다.
서두에선 "서양인에게 공포의 대상"으로 소개해 놓고 본론에선 용장아닌 덕장으로 보이니 말이다.
그러면서도 전장을 누비는 영웅의 기상을 보이려고 애쓴 흔적이 역력하다.
이 영화는 칭기즈칸의 일대기가 아닌 황제 이전의 "테무진시대"로 배경이 좁혀져 있다.
감독으로선 정복자의 웅대한 활동무대를 보이기엔 아무래도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그보다는 용맹한 전사가 아닌 따뜻한 인간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더 동양적으로 여겼을 법 하다.
여하튼 분명한 것은 이 영화가 칭기즈칸을 새로운 각도로 조명했다는 사실이다.
그점을 잊고 "동양의 보배"에 집착해 서양을 유린하는 위풍당당만 기대한 것은 할리우드영화에서 길들여진 치기때문일 것이다.
편집위원 jsrim@ked.co.kr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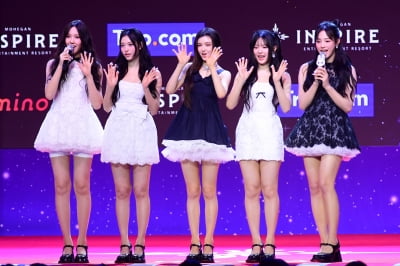




![기업실적 호조에 일제히 상승…테슬라는 최대폭 매출 감소[뉴욕증시 브리핑]](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ZA.36457219.1.jpg)


![[단독]하이브 키운 '멀티 레이블'이 제 발등 찍었다](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02.33877838.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