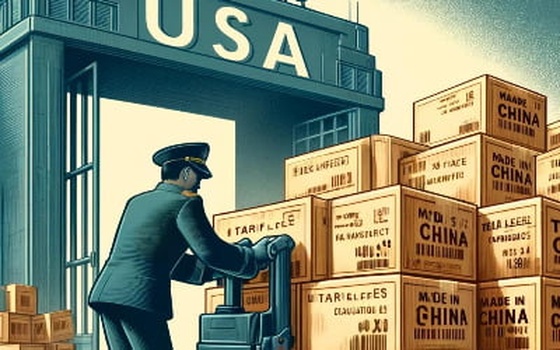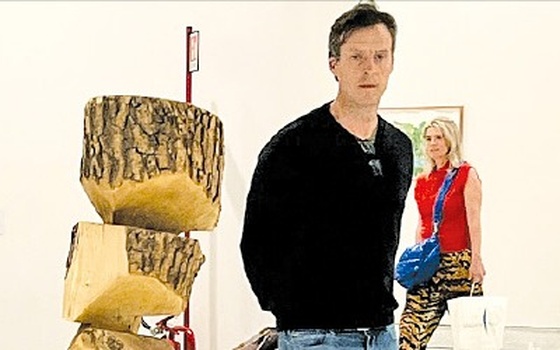Family Site
분야별 주요뉴스
- 글자크기
-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5단계
- 글자행간
-
- 1단계
- 2단계
- 3단계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 입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기사를 삭제 하시겠습니까?




![올해 금리 인하 '급제동'…파월 "인플레 잡을 때까지 현상 유지" [Fed워치]](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01.36442741.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