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자금 부담 늘어 M&A시장 위축 불가피"
"과도한 프리미엄 해소 기대
상장폐지 요건도 완화해야"
21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국내 M&A 시장 관계자들은 의무공개매수제도의 영향이 기업보다 PEF에 더 클 것으로 내다봤다. 통상 기업은 인수한 기업을 재매각해 차익을 얻기보다 사업적 시너지를 내려는 목적으로 M&A에 나선다. 돈이 좀 더 들더라도 지분을 더 확보하는 데 큰 거부감이 없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M&A 대금을 연기금 등 외부 출자자(LP)로부터 조달하는 PEF들은 소액주주 지분까지 떠안게 되면서 인수 부담이 커질 것을 걱정하고 있다. 현재도 국내외 금리 인상 여파로 돈을 모으기 쉽지 않은데 조달 자금 규모까지 커지면 M&A 시장이 정체될 것이란 우려다.
국내 한 대형 PEF 대표는 “상장사에 50% 미만 지분을 투자한 후 고점에 물려 있는 PEF엔 대형 악재”라고 말했다.
PEF들은 제도 도입에 맞춰 중·장기 투자전략을 수정하기 위해 고심 중이다. 인수 대상 지분이 커지다 보니 대주주들이 과도한 경영권 프리미엄을 요구해 온 관행이 완화될 것이란 기대도 있다. 매각 측이 무리한 ‘웃돈’을 고수하면 그만큼 소액주주에게 지급할 금액도 커져 거래 성사가 불투명해지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국내에서도 상장사 주식을 공개매수한 후 상장폐지하고 기업가치를 키워 재상장하는 미국식 경영권 거래 구조가 활성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올해 4월 트위터 지분 9.2%를 사들이고 곧바로 공개매수로 트위터 주식 전량을 434억달러(약 53조원)에 인수한 뒤 상장폐지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과 함께 상장폐지 요건 완화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아쉬워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내에선 상법상 대주주가 95%의 지분을 확보해야 나머지 5% 주주의 동의 없이도 상장폐지할 수 있는 ‘스퀴즈아웃(축출)’ 조항을 두고 있다. 업계에선 5%의 범위가 좁아 일부 주주가 ‘알박기’에 나서면 상장폐지가 불가능하다는 불만이 있었다. 이를 일본처럼 90% 수준으로 완화해야 공개매수 때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차준호 기자 chacha@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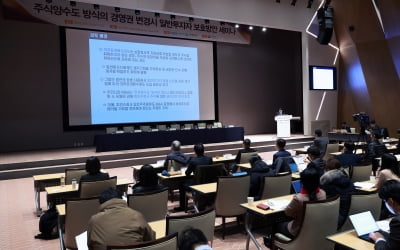


!["14억이 전기차 타야하는데"…인도, 리튬·니켈 확보전 뛰어든다 [원자재 포커스]](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01.36506152.1.jpg)


![[단독]하이브 키운 '멀티 레이블'이 제 발등 찍었다](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02.33877838.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