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쿠팡이츠 "나 떨고 있니"…불투명한 배달 플랫폼의 미래 [박동휘의 컨슈머 리포트]

플랫폼 효과 못 누리는 국내 배달앱들
첫번째로 해봐야 할 질문은 배달앱을 플랫폼 기업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다. 최근 플랫폼이라는 용어가 지나치게 다양한 용법으로 쓰이고 있어서 문제인데, 이 경우 플랫폼은 데이터, 소프트웨어, 네트워크를 독점함으로써 이익의 승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기업을 말한다.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을 비롯해 한때 ‘양쯔강의 악어’로 불렸던 마윈의 알리바바 등을 대표적인 플랫폼 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에선 네이버와 카카오 정도가 네트워크 효과를 통한 플랫폼 자본주의를 실현한 기업으로 꼽을 수 있다.
국내 배달앱들이 강력한 플랫폼 효과를 누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통제 불가능한 경영상의 변수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 변수들은 배달앱이 유지되기 위한 핵심이다. 음식을 만드는 식당주인, 이를 가져다주는 배달대행업체들과 여기에 소속된 수만명의 배달 라이더, 돈을 내고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최종 소비자 등 3각 주체가 배달앱을 떠받치는 기둥들인데, 정작 배달앱은 이들에 대해 아무런 통제 장치를 마련하기 어렵다. 단선적으로 비교하기는 힘들지만, 원료와 근로자는 물론이고 최종 완성품의 품질도 공장주의 손을 떠나 있는 것과 비슷하다.
천정부지로 오르는 배달비에 관한 오해와 진실
배달비가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배달 거부 운동까지 일고 있는 최근의 현상은 배달앱이 직면한 난관이 무엇인 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배달비는 소비자가 지불하는 배달팁과 식당주인이 내는 배달료의 합이다. 흔히 라이더로 불리는 배달원이 가져가는 몫이다. 예컨데 배민 앱에서 치킨 한 마리를 시킬 때 거리에 따라 2000~3000원 정도의, 소비자가 부담해야하는 금액이 배달팁이라고 표시된다. 여기에 업주가 배달대행업체에 지불하는 배달료(업체마다 상이)가 더해지면 라이더의 수입, 즉 배달비가 되는 셈이다. 이런 구조를 정확히 알 길이 없는 소비자들은 배달비가 오를 때마다 마치 쿠팡이츠, 배민 같은 배달앱들이 가격을 올리는 것으로 오해하곤 한다.
라이더에 관한 또 다른 문제는 이들이 기존의 배달대행업체들에 소속돼 있다는 것이다. 마치 CJ대한통운 등 택배사들이 고객 주문만 받을 뿐, 실제 배송은 전국의 택배 대리점에 소속된 개인 차주에 맡기는 것과 동일한 구조다. ①배달주문 앱 통한 주문 → ②음식점에 연결 → ③배달대행업체로 연결 → ④배달원이 픽업 → ⑤소비자에 배달이 전형적인 배달 서비스의 흐름이다. 배민만 해도 전체 주문의 95% 가량이 이런 방식으로 처리된다. 나머지 5% 정도만 배달앱이 자체 라이더들을 통해 음식을 배송한다. 평소 배달을 안하던 맛집들은 평소 배달대행업체들을 이용한 적이 없는 데다 배달 중 맛의 보존을 중시하기 때문에 배달앱이 제공하는 소위 단건 배달을 선호한다. 쿠팡이츠는 이 부분을 집중 공략함으로써 서울 등 대도시에서 배민의 아성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다. 한 배달업체 관계자는 “단건 배달은 배달앱 입장에선 적자를 감수할 수 밖에 없는 무리수이긴 하지만 라이더들을 기존 배달대행업체에서 떼어내는 효과가 있다”며 “배달앱들은 소위 클라우드 소싱을 통해 라이더들을 통제하고 싶어한다”고 지적했다.
"배달 최적 경로를 찾아라", 업체들 사활 건 경쟁
도어대시 등 미국과 유럽의 배달 플랫폼들은 배달원 리스크라는 측면에선 한국보다 유리한 편이다. 음식 배달이란 서비스가 거의 없던 터라 도어대시만해도 자기 입맛대로 ‘대셔’라고 불리는 배달원들을 플랫폼 노동에 묶어둘 수 있었다. 다만, 독일의 딜리버리히어로 등 유럽계 배달앱들은 긱 노동(Gig Work)의 임금에 대해 정부가 개입하기 시작하면서 쇠락 일로를 걷고 있다. 배민의 최대주주이기도 한 딜리버리히어로가 안방에서의 거듭된 실패로 한국 등 아시아 시장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은 이 같은 배경에서다.거의 모든 플랫폼 비즈니스가 그러하듯이 국내 배달앱이 맞닥뜨릴 또 다른 난관은 규제 리스크다. 배민을 비롯해 상당수 배달앱들은 공유주방 등을 통해 일종의 자체 음식을 만드는 방안을 고민해왔다. 이와 관련해 정현식 프랜차이즈협회 회장은 얼마 전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배달앱들이 직접 음식 사업에 뛰어드는 것”이라며 “쿠팡 치킨이나 배민 떡볶이가 나오지 말란 법은 없지 않냐”고 반문했다. 하지만 배달앱들이 음식을 직접 만들어 배달까지 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골목 상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논란을 감안해 배민 등은 맛집 음식의 밀키트화(化)를 지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다.
12년 전 청년 김봉진이 강남의 밤거리를 헤매다 떠올린 ‘룬샷’이 코로나19라는 아주 특별한 계기를 만나 수십조원의 배달 시장으로 현실화됐다. 누가 최종 승자가 될 지는 아무도 모른다. 불투명한 미래를 개척하는 기업이 승자독식의 왕관을 차지할 것이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최적의 배달 경로를 찾기 위해 각사마다 치열하게 IT 투자를 단행하는 것은 ‘쩐(錢)의 전쟁’으로는 도저히 활로를 찾을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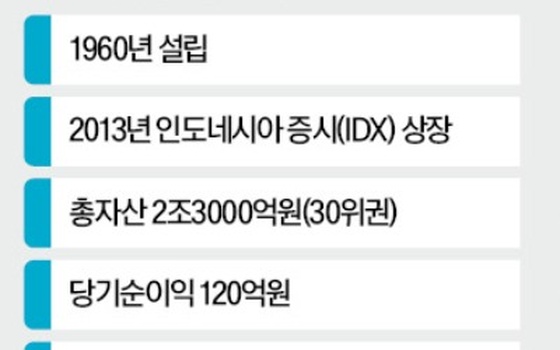






![[신간] 배삼식 희곡집 '토카타'](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ZK.36526694.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