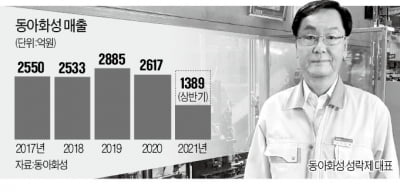"급여 10년前 후퇴"…조선·뿌리산업 4만명 떠났다
남은 자, 잔업수당 사라지자 '투잡' '스리잡' 일상화
떠난 자, 일당높은 건설·플랜트업종으로 이직 급증
올해부터 중소기업에 본격 적용된 주 52시간제 여파로 조선업계와 뿌리산업의 고용불안이 가속화하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실질임금이 감소하면서 근로자들이 대거 투잡에 나서거나 생산현장을 떠나는 ‘엑소더스’가 심각한 상태다.
조선·뿌리업계에선 올해 4만 명 이상의 생산직 인력이 이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제신문이 현대 삼성 등 대형 조선사 5곳의 협력사 470곳을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생산직 인력 7600명이 이탈했다. 전체 사내협력사 근로자(5만여 명)의 약 15%에 이르는 수치다. 김수복 조선5사 사내협력사연합회 회장은 “선박 제조의 80%를 담당하는 사내협력사의 인력이 부족해지면 납기 지연이 불가피해 한국 조선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부분 영세한 규모의 뿌리업계도 50인 미만 사업장에 주 52시간제가 적용된 지난 7월부터 인력 이탈이 급증하고 있다. 표면처리(도금) 열처리 등 6개 분야 뿌리업종 협동조합에 따르면 지속적인 최저임금 인상, 원자재가 급등 등의 여파까지 겹쳐 올 들어서만 3만여 명의 인력이 감소했다.
조선·뿌리업계에서 이탈한 인력은 대부분 아직 주 52시간제 적용을 받지 않는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옮기거나 기술 활용도가 비슷하고 임금 수준이 높은 건설·플랜트업체로 이직하는 추세다. 남아 있는 근로자들은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엔 배달·퀵서비스 아르바이트를 하며 불안한 생계를 꾸리고 있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중소기업의 피해가 큰 만큼 주 52시간제를 유연하게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