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가상화폐·가상자산…뭐라고 불러야 하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말 기자간담회에서 꺼낸 얘기다. 국내에선 이른바 ‘코인’을 부를 때 암호화폐, 가상화폐, 가상자산 같은 다양한 용어를 섞어 쓰고 있다. 공식적으로 정립된 개념도 없고 실체도 인정받지 못해 생긴 일이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코인에 화폐라는 말을 붙이는 것을 극도로 경계한다. 금융당국 관점에서 코인은 화폐의 3대 조건인 △가치의 저장 △가치의 척도 △교환의 매개 기능 중 어떤 것도 충족하지 못한다. 내재 가치가 없는 컴퓨터 파일 조각을 어떻게 화폐라고 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홍 부총리가 가상자산이란 호칭을 애써 강조한 이유다. 암호화폐거래소에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지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도 코인을 가상자산으로 정의했다.
학계에서는 대체로 암호화폐라는 용어를 쓴다. 영어권에서 일반화된 ‘cryptocurrency’를 직역한 것인데,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기술을 활용한 화폐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대중에겐 가상화폐라는 이름도 친숙하다. 다만 가상이라는 단어가 ‘실체가 없는 가짜’라는 인상을 풍기고, 인터넷의 사이버 머니와 구분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관련 업계 종사자들은 썩 좋아하지 않는 표현이다. 거래소들의 단어 선택도 제각각이다. 빗썸과 코빗은 자사를 ‘가상자산거래소’로 소개하고, 업비트는 ‘디지털자산거래소’라고 한다. 가상자산거래소의 경우 특금법의 정의를 충실하게 따랐다고 볼 수 있다. 업비트는 지난해 3월 암호화폐에서 디지털자산으로 표현을 통일했다. 업비트 측은 “암호는 어감이 너무 기술적이고, 향후 가상자산에 유무형의 다양한 대상이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법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가장 포괄적인 표현을 찾은 것”이라고 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부인 반대에도…8년 전 비트코인 투자한 '천재 남편' [임현우의 비트코인 나우]](https://img.hankyung.com/photo/202105/01.26233478.3.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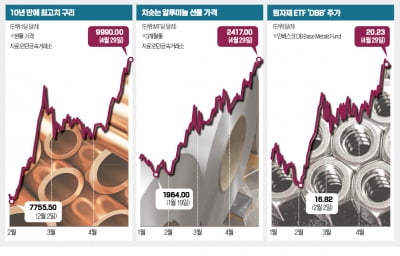










!['베니스의 장인들' 르네상스 조선소에 쿵쿵쿵 망치질! 클래스가 달랐던 토즈 전시 [2024 베네치아 비엔날레]](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01.36496137.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