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이사제, 1940년대 독일 모델을 법으로 강제하는 건 넌센스
한국은 기업 소유형태도 독일과 달라...
노조의 경영참가는 '노사 자치'의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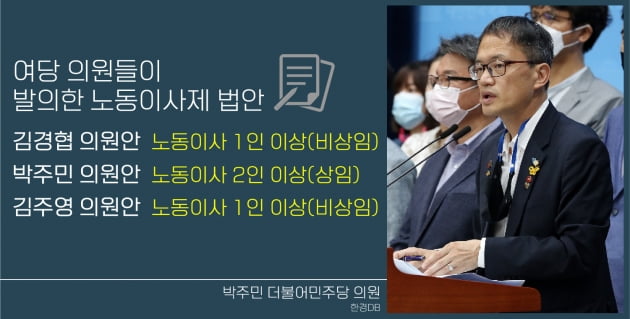
김강식 한국항공대 교수가 한국질서경제학회 학회지 2021년 3월호에 발표한 ‘노동이사제 법제화, 필요한가?’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한 독일의 전범 기업들이 연합국의 직접 통제를 모면하기 위해 노조를 앞세웠던 게 노동이사제가 등장한 배경이라고 김 교수는 설명한다.
산별노조가 주축을 이루는 독일 노조는 개별 기업 수준에서는 교섭이 이뤄지지 않고, 노조의 경영 참가도 가능하지 않다. 노동이사제는 기업 경영에 관여할 훌륭한 수단인 만큼 노조는 이를 반기는 입장이었다.
주주 중심의 서구 국가들과는 달리 소수의 기업가와 은행이 지배하는 독일 기업은 경영 집행을 책임지는 경영이사회와 그 상부 기관인 감독이사회로 이원화돼 있는 것이 특징이다. 보통 근로자 대표의 추천을 받는 노동이사가 참여하는 이사회는 ‘감독이사회’다. 1000명 이상의 광산, 철강기업 이사회에 노동이사를 두도록 한 1951년의 몬탄공동결정법 등에 법적 근거를 뒀다.
그 후 독일에서 노동이사제를 놓고 긍정 또는 부정적인 평가가 다양하게 나오고 있지만 현실에서 노동이사제를 운영하는 기업 수는 지속해서 감소해 왔다. 2018년 노동이사제(공동결정제)를 운영해야 하는 기업의 약 3분의 1 가량이 노동이사제를 회피하는 실정이다. 기업 운영 여건에 비춰 볼 때 노동이사제가 잘 기능하지 못한다는 방증이다.
노동이사제가 점차 위축되는 것은 독일 이외에도 노동이사제를 채택하는 스웨덴, 오스트리아 등 유럽 국가들의 공통 현상이다. 공기업 민영화 등의 조치와 함께 노동이사제를 뒷받침하는 법적 장치도 약화된 결과다. 예외적으로 프랑스만이 노동이사제가 확대돼 2013년 법 개정으로 민간 대기업까지 노동이사를 두도록 했다.
기업 형태 측면에서도 독일과 한국은 매우 다르다. 독일은 주식회사 형태의 기업이 1% 정도인 데 반해 유한회사가 95% 이상이다. 반면 한국은 주식회사가 95% 이상이다. 독일처럼 은행에서 자본을 조달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시장에서 조달한다. “우리처럼 주주 중심의 기업 운영 시스템이 주를 이루는 미국, 영국, 일본 등의 국가들은 노동이사제를 두고 있지 않다”는 게 김 교수의 설명이다.
독일처럼 감독이사회, 경영이사회로 이원화돼 있지 않고 단일한 이사회로 구성된 한국 기업에서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 결과적으로 독일보다 훨씬 더 큰 권한을 노동이사가 갖게 된다는 점도 지적된다.
김 교수는 “노동이사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노사자치의 영역이지 국가가 입법적으로 개입하면 헌법적 가치를 오히려 훼손하게 된다”며 결론을 맺고 있다.
최종석 전문위원 jsc@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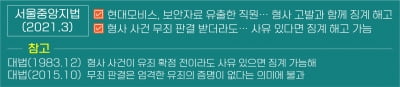


![하루 만에 550조원 증발…실적·물가 압력에 기술주 투매 [글로벌마켓 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B20240206081554930.jpg)


![[단독] "경영보다 돈"…아워홈 매각 손잡은 남매](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AA.36472890.1.jpg)





![[신간] 로마 제국이 '최고 국가'로 우뚝 서기까지…'팍스'](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ZK.36477517.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