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 종류만 8899개…비트코인 빼곤 모두 알트코인
‘8899.’21일 오후 4시 기준 암호화폐 시황중계사이트인 코인마켓캡이 집계한 세계 암호화폐거래소에 등록된 암호화폐 개수다. 전체 암호화폐 시가총액 가운데 비트코인의 비중이 60%에 달하고, 나머지 암호화폐(알트코인)가 40%를 나눠 갖고 있다. 하지만 알트코인은커녕 비트코인도 잘 모르고 투자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주식에 투자하듯 암호화폐도 알고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중앙은행은 신뢰 저버렸다”… 비트코인의 시작비트코인은 시중에 거래되는 최초의 암호화폐다. 2008년 자신의 이름이 나카모토 사토시이며 일본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한 사이트에 ‘비트코인: 개인 간(P2P) 전자화폐시스템’이란 논문을 발표하면서 비트코인의 시초가 된 아이디어를 내놨다. 비트코인의 핵심은 이 논문 첫 문장에 나온다. “P2P 방식의 전자화폐는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결제한 사람으로부터 결제받은 사람에게 직접 전송된다.”비트코인은 금융위기 당시 기존 금융시스템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중론이다. 나카모토가 비트코인 논문을 공개한 시점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지면서 미국 중앙은행(Fed)의 첫 양적완화가 시작된 2008년 3월께다. 그는 2009년 2월 비트코인 발행을 앞두고 작성한 백서에서 “중앙은행은 법정통화 가치에 논쟁의 여지가 없도록 신뢰를 받아야 하지만, 화폐의 역사는 그런 신뢰를 완전히 저버린 사례로 가득하다”고 Fed를 비판했다. “은행은 우리의 돈을 안전하게 보관해야 하지만, 그들은 무분별한 대출로 신용버블을 유발했다”며 은행에 대한 불신도 백서에 드러냈다.비트코인이 ‘금으로의 회귀’라고 불리는 이유 중 하나다. 금도 화폐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전까지는 개인끼리 주고받을 수 있는 결제수단이었다. 지금은 A은행 계좌에서 금융결제원의 은행공동망을 거쳐 B은행 계좌로 돈이 이동한다. 비트코인은 A은행과 B은행, 금융결제원 없이 직거래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중앙은행이 개입해 비트코인의 가치를 조절할 수도 없다. 금본위제가 유지된 1970년대까지만 해도 화폐의 가치를 뒷받침했던 것이 금인 만큼 비트코인도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다만 A의 지갑에서 B의 지갑으로 비트코인을 전송하는 데 10분이 걸린다는 점 때문에 현재는 결제수단이라기보다 투자자산으로 주목받고 있다.발행량이 제한돼 있다는 점도 금과 비슷하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다. 채굴된 비트코인은 21일 기준 1652만 개로 4년마다 채굴량이 절반으로 줄면서 2145년 2100만 개를 끝으로 발행이 끝난다. 4년 주기로 채굴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을 ‘반감기’라고 부른다. 이미 2012년에 첫 반감기를 맞은 상태다. 4년 단위로 반감기를 맞은 2016년과 지난해 비트코인 가격이 큰 폭으로 뛴 것도 이 같은 공급 구조와 무관치 않다는 것이다. 또 다른 암호화폐 탄생시킨 이더리움암호화폐 시총 2위인 이더리움은 ‘비트코인 2.0’으로 불린다. A지갑에서 B지갑으로 이더리움이 전송되는 시간은 12초 정도로 비트코인보다 빠르다. 이더리움이 결제수단으로서의 가치가 비트코인보다 있다고 평가받는 근거다.비트코인과의 차이점은 발행량이 한정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투자자산으로 비트코인만큼 주목받지 못하는 이유다. 2014년 이더리움을 개발한 비탈릭 부테린은 전체 발행량 한도를 두지 않은 대신 연 1800만 개만 발행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이더리움의 가치가 큰 폭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낮다는 주장도 여기에 근거하고 있다. 발행량이 제한되지 않은데도 여전히 시총 2위를 차지하는 것은 이더리움의 장부를 활용한 암호화폐가 많아서다.은행 간 송금 용도로 개발된 리플(시총 7위)도 잘 알려진 알트코인 중 하나다. 건당 5만원씩 내고 청산까지 하루가 걸리는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망 송금과 달리 수수료 없이 2~3초면 송금이 가능한 방식이다.■ 코인 문제 정답!첫 번째 줄(왼쪽부터)베이직어텐션토큰, 비트코인, 픽셀, 도지코인, 리플, 휴먼스케이프, 이더리움, 아이오타, 라이트코인, 넴두 번째 줄트웰브쉽스, 펀디엑스, 페이코인, 크립토닷컴체인, 시빅, 쿼크체인, 캐리프로토콜, 칠리즈, 이오스, 옵저버세 번째 줄오브스, 엠블, 엔진코인, 에브리피디아, 앵커, 아하토큰, 아르고, 쎄타퓨엘, 퀀텀, 썸씽네 번째 줄썬더토큰, 시아코인, 스톰엑스, 레드코인, 솔브케어, 센티넬프로토콜, 에이다, 샌드박스, 네오, 아이콘다섯 번째 줄비트토렌트, 보라, 밀크, 메타디움, 메인프레임, 메디블록, 무비블록, 람다, 디카르고, 리퍼리움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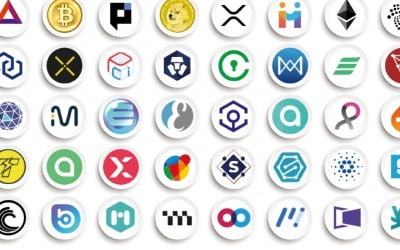





![[단독]하이브 키운 '멀티 레이블'이 제 발등 찍었다](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02.33877838.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