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일리지 소멸' 올해 시작…사용처 부족·교환가치 떨어져 소비자 불만
신용카드 제휴로 마일리지 남발
쌓아 놓고도 무용지물 전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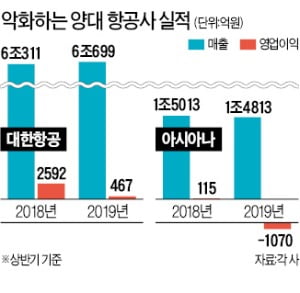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도 없는데 없애는 건 불합리하다”는 불만이 뒤따랐다. 지난 2월 항공사들을 상대로 ‘마일리지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한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항공사들이 전체 좌석의 5~10%만 마일리지로 살 수 있게 해놨고, 성수기에는 이마저도 더 줄여 실제 이용률은 1~3%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양대 항공사는 마일리지 사용처를 늘리라는 요구에 렌터카 이용, 호텔 예약 등에 쓸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마일리지 교환 비율이 소비자에게 불리해 항공권 구매 외에 다른 곳에 마일리지를 사용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계산한 결과를 보면, 제주도에서 중형 렌터카를 빌릴 때 현금으로 결제하면 2만6500원이지만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계산하면 현금 17만6000원에 해당하는 8000마일리지가 필요했다.
항공사들이 마일리지 발행을 남발한 것도 사용처 부족의 원인으로 꼽힌다. 마일리지 제도는 비행기를 자주 타는 고객을 위한 일종의 보너스 개념으로 시작됐다. 하지만 항공사들이 1990년대 후반부터 신용카드사와 손잡고 항공 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카드를 발급하면서 마일리지 발행이 급격히 늘었다.
항공사는 마일리지 발행 대가로 카드사에서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이른바 ‘마일리지 장사’를 해서 손쉽게 돈을 벌었다. 소비자로선 마일리지로 살 수 있는 항공권은 한정돼 있는데 마일리지를 보유한 사람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사용이 더 힘들어졌다. 공정위는 항공사들의 이 같은 행위가 불공정거래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올해 초 양대 항공사 본사 사무실을 현장 조사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매그니피센트7' 실적 먹구름…지수 혼조 [뉴욕증시 브리핑]](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01.36519299.1.jpg)








![살인과 고문조차 서슴치 않았던 폐륜의 과학자와 의사들 [서평]](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01.36520524.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