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적합업종 보호 대상, 소상공인으로 한정해야"
중견기업연합회도 우려 표명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4일 “업종 신청 주체를 소상공인 단체로 한정하고 있지만 규제 대상은 중견·대기업”이라며 “규제를 받지 않는 일정 규모 이상의 중기업에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견련은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적합업종제도와 비슷한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 등 운용 실태에 관한 2016년 감사원 감사보고서를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계약업체 1만1513개 중 상위 10% 업체가 전체 납품금액의 77.2%, 상위 20% 업체가 90.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제도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해 공공조달시장 참여를 중소기업으로 제한했지만 소수 기업에만 혜택이 집중되는 부작용이 있다고 지적했다.
중견련은 특별법에 명시된 ‘생계형 적합업종’의 정의 및 지정 기준도 문제라고 밝혔다. ‘다수의’ ‘현저하게’ 등 불명확한 표현이 사용돼 적합업종을 지정할 때 심의위원회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크다는 설명이다.
중견련은 “생계형 적합업종 위반 기업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이 기업 존폐에 큰 영향을 미칠 중복적이고 과도한 제재 조치”라며 반드시 삭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위반사실을 공표하도록 한 데다 매출의 5% 이내에서 이행강제금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중견련은 특별법이 업종 지정 기간을 5년으로 명시했지만 재지정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아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와 함께 중견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이중고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특정 업종을 전문화한 중견기업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이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직격탄이 될 수 있어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규태 중견련 전무는 “소비자 후생을 희생하면서 만든 법안인 만큼 골목상권을 보호하겠다는 법안 취지를 명확히 살려 업종 선정 및 운영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설리 기자 sljun@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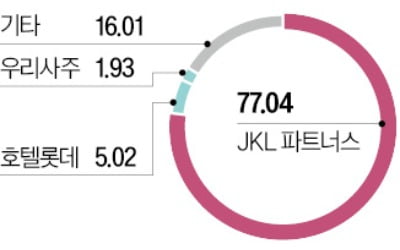











![MBC '뉴스데스크' 앵커 출신 박혜진, 파격 근황 봤더니 [이일내일]](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01.36513659.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