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미디어 뉴스룸-BUSINESS] "임팩트 금융이 새로운 시대의 '주류'될 것"
"커지는 사회 불평등, 시장의 창의성으로 해결할 수 있다"
![[한경 미디어 뉴스룸-BUSINESS] "임팩트 금융이 새로운 시대의 '주류'될 것"](https://img.hankyung.com/photo/201803/AA.16110857.1.jpg)
그런 이 위원장이 최근 재무적 가치(수익)와 사회적 가치(공공문제 해결)를 동시에 추구하는 ‘임팩트 투자’라는 새로운 화두를 제시하고 나섰다. 지난해 5월 국내에서 임팩트 금융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임팩트금융추진위원회’를 발족했다. 27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조성해 직접 투자에 나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이 위원장에게 임팩트 금융에 대해 들었다.
▷임팩트 금융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10여 년 전부터 관심을 가졌다. 한국은 경제적으로 급속한 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었지만 지나치게 압축 성장을 하다 보니 사회적 불균형과 같은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런 문제를 지켜보면서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한계를 많이 느꼈다. 이런 한계를 넘어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필요한 게 무엇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고민의 결과가 임팩트 금융인가.
“그렇다.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봤다. 기업 운영의 ‘투명성’과 ‘사회적 책임’ 그리고 ‘지배구조’ 문제다. 그중 투명성 문제는 어느 정도 자리 잡았다고 본다. 그다음 문제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인데, 임팩트 금융은 이런 기업 문화가 자리 잡기 위한 밑거름이다.”
▷임팩트 금융이 현재 불거지는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깨달은 게 있다. ‘대량생산 체제를 바탕으로 한 우리 시대의 자본주의 체제’는 이미 끝났다는 거다.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면 많은 인력이 ‘지금과 같은 일자리’를 유지하기가 힘들어진다. 사회적 불평등이 커질 수밖에 없다. 기존에는 이런 문제를 정부 주도로 해결하려고 했다. 앞으로는 사회적인 위험이 일상화되고 광범위해질 거다. 정부 주도의 복지 시스템, 사회적 안전망 등으로는 애초에 해결이 불가능해진다. 그러면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을까. 시장에 직접 참여하는 사람들, 그중에서도 ‘사회적 기업가’들이다.”
▷시장경제 원칙을 허물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는데.
“아니다. 나는 기본적으로 시장주의자다. 시장경제 체제 안에서 창의적으로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야 한다는 의미다. 생태계가 달라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금융이 바뀌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임팩트 금융은 앞으로 자본주의를 이끌어 갈 전혀 다른 방식의 금융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머지않아 임팩트 금융이 전통 금융의 보완재가 아니라 ‘새로운 주류 금융’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
▷임팩트 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 주도’를 강조하고 있는데.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시장 안에서, 그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주도해야 ‘창의적’이고 ‘다양한’ 해결 방식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는 사회적 불평등을 해결해 달라는 높은 압력을 받으며 출범했다. 이 상태에서 정부가 조급하게 성과를 내려 하다가는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기에 앞서 내가 먼저 이 화두를 민간 차원에서 던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2700억원 펀드 조성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나.
“정부 지원 없이 민간 중심으로 자금을 유치하려고 한다. 시장에서 돈이 나와야 이 돈이 사회적 기업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더 경쟁력 있고 건강한 생태계로 만드는 데 쓰일 수 있다. 생각보다는 자금 유치가 천천히 진행되고 있다. 현재 40억원 정도를 유치했다. 임팩트 금융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아직 확산되지 못한 이유도 있고, 시기적으로 최순실 스캔들이 불거진 지 얼마 안 된 상황이어서 기업들이 참여하는 데 소극적인 탓도 있다. 하지만 정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임팩트 금융에 재원이 유입되는 데 필요한 법적·제도적인 여건이 조성된다면 올해 안에 투자자금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정흔 한경비즈니스 기자 vivajh@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엘리뇨 가고 라니냐 온다…중미, 곡물 생산 차질 우려 [원자재 포커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404/01.36469281.3.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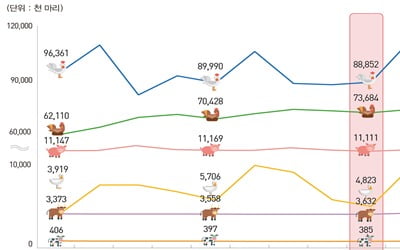



![넷플릭스, 가입자 순증 꺾였다…악재 쏟아진 기술주 [글로벌마켓 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B2024041907203332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