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 오피니언] 자동차, 공유의 끝은 무소유
![[오토 오피니언] 자동차, 공유의 끝은 무소유](https://img.hankyung.com/photo/201802/AA.16073889.1.jpg)
물론 공유는 한국에서도 진작부터 등장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1998년 외환위기 때 나온 ‘아나바다’ 운동이다.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자’는 캠페인이 대한민국 전역을 휩쓸었다. 게다가 경기가 회복된 뒤에도 비용 면에서 소유하는 것보다 이익이라는 계산이 확산되면서 공유 경제의 개념은 유지됐다.
그런데 여러 명이 나눠 쓰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이용 패턴과 시간을 파악해야 했다. 그래서 고민하던 중 2000년 후반 모바일 활성화가 공유 사업의 형태를 획기적으로 바꿔버렸다. 특히 승용차의 경우 하루평균 주차 시간이 23시간에 이른다는 사실이 부각됐고 대표적인 공유물로 빠르게 자리잡았다. 모바일 기반 자동차 공유기업 우버는 단숨에 글로벌 시장의 강자가 됐고, 중국 내 디디추싱 또한 수많은 자동차회사의 러브콜을 받는 중이다.
최근 국내에서도 자동차 공유사업은 용도와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진화 중이다. 출퇴근 시간을 이용한 카풀이 있는가 하면 네이비처럼 거주지를 곧 차고지로 활용한 거주형 공유사업에 적극적인 곳도 있다. 이들은 모두 개인의 자동차 소유욕을 낮추는 데 집중한다. 그래야 공유 서비스 이용자와 시간이 늘어날 수 있어서다.
기업 내 공유사업도 주목받는 것 중 하나다. 개인용과 업무용을 절반씩 섞은 형태로, 회사가 임대한 업무용 렌터카를 직원 개인이 이용하되 비용은 절반씩 부담하는 방식이다. 평일 낮 시간에는 업무용으로 쓰고 저녁과 주말에는 개인이 쓴다. 법인과 개인의 공유인 셈이다.
그렇게 보면 자동차에서 공유는 여러 분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한 대를 여러 이용자가 나눠 이용하는 게 공유의 기본 개념이었다면 업무용과 개인용이라는 용도 공유 외에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과 세단을 보유한 사람이 필요할 때 차를 바꿔 타는 형태별 공유도 어렵지 않다는 뜻이다. ABI가 예측한 것처럼 미래에는 자동차를 개인이 직접 소유하는 것보다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만 쓰는 시대로 변하니 말이다. 이럴 때 계속 생산 규모를 유지해야 하는 자동차회사는 어떤 전략을 선택할까? 전통적 개념에서 자동차 제조사의 권력을 송두리째 흔드는 것은 전기차도 아니고 자율주행도 아니라 자동차 무소유를 자극하는 공유 사업이다.
권용주 < 오토타임즈 편집장 soo4195@autotimes.co.kr >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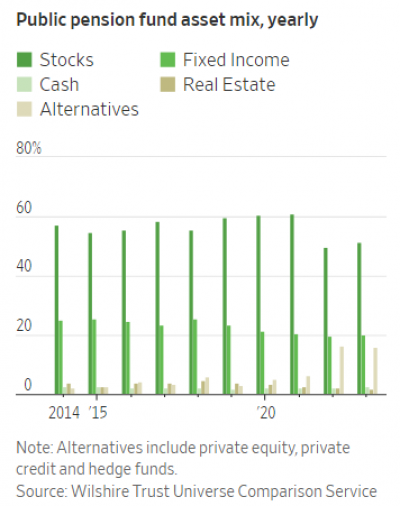




![넷플릭스, 가입자 순증 꺾였다…악재 쏟아진 기술주 [글로벌마켓 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B2024041907203332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