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이란, 오늘 OPEC 감산회의 치킨게임
감산합의 실패하면 유가 배럴당 35달러 수준 폭락 예상
석유수출국기구(OPEC)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이라크가 30일(이하 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리는 산유량 감축 회의를 앞두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사우디는 2년 전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국제유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이란과 이라크가 감산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원하지만, 이들 나라는 자국의 산유량을 최대한 확보하려 한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이란은 29일 OPEC에 보낸 편지에서 사우디가 원유 생산량을 2015년 11월 수준인 하루 평균 950만 배럴로 줄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는 현재보다 100만 배럴 정도 적은 양이다.
사우디가 이란에 감산 규모를 제시하자 이란도 응수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제제재 이전 수준의 시장점유율을 회복하고 싶어하는 이란은 앞서 하루 397만5천 배럴에서 자국의 생산량을 동결하겠다고 제안했었다고 블룸버그는 OPEC 회원국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사우디는 이에 대응해 이란에 생산량을 370만7천 배럴로 제한하라고 압박했다.
이에 알제리가 중재자로 나서 379만5천 배럴을 제안한 상태다.
사우디는 자국의 생산량은 50만 배럴 줄이겠다고 했다고 OPEC 소식통들은 전했다.
이라크 역시 이슬람국가(IS)와 싸우는 데 돈이 필요하다면서 생산량 한도를 늘리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라크는 감산의 기준이 되는 OPEC의 생산량 통계가 자국의 생산량을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주장하다 이 통계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태도를 누그러뜨렸다고 FT가 전했다.
다만 이라크는 사우디가 원하는 감산이 아니라 아직 OPEC의 통계를 기준으로 한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이라크는 재원 확보를 위해 협상을 타결하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타협할 가능성이 있다고 FT는 전했다.
이란과 이라크는 합쳐서 하루 800만 배럴을 생산하며 사우디는 1천50만 배럴 수준이다.
인도네시아의 이그나시우스 조난 에너지장관은 29일 기자들에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두고보자"고만 말했다.
사우디는 이란과 이라크의 동참 없이는 감산합의를 아예 무산시킬 수 있다고 시사하고 있다.
사우디의 칼리드 알팔리 석유장관은 28일 "OPEC의 개입 없이도 2017년에 수요가 회복되고 가격이 안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우디는 시장이 진지하게 받아들일 만큼 OPEC이 100만 배럴 이상을 감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우디는 이런 대규모 감산이 러시아 등 OPEC 비회원국의 협조를 얻는데도 필수적이라고 여긴다고 소식통이 FT에 말했다.
OPEC이 지난 9월 잠정적으로 합의한 하루 생산량 3천250만 배럴 목표를 달성하려면 100만 배럴을 감산해야 한다.
사우디는 이란, 이라크 외에 OPEC 비회원국인 러시아를 감산에 동참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우디와 러시아는 올해 앞서 석유시장 정상화에 합의했다.
사우디는 OPEC이 합의를 이룬 후 러시아가 이전의 약속을 지킬 것을 원한다.
사안의 중대성 때문에 감산 논의는 최고위급에서 이뤄지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8일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석유시장의 균형을 위한 감산을 위해 양국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사우디에서는 실세인 부왕세자 모하메드 빈살만 왕자가 석유정책을 이끌면서 장관과 긴밀히 지시하고 있다.
OPEC은 30일 공식 회의에 앞서 아침에 비공식적으로 일찍 만나 감산을 위한 논의를 할 예정이다.
모건스탠리와 맥쿼리는 합의가 무산되면 국제유가가 배럴당 35달러까지도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골드만삭스는 합의 없이도 내년 중반까지 평균 유가가 45달러 정도 되리라 전망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kimyg@yna.co.kr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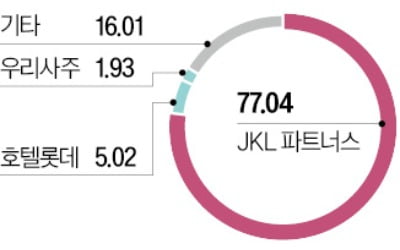











![MBC '뉴스데스크' 앵커 출신 박혜진, 파격 근황 봤더니 [이일내일]](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01.36513659.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