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 배출 저감기술에 인센티브 확대해야"
'기후변화 대응 기술금융 활성화' 세미나
2020년후 신기후체제 대비
에너지 효율화 기술 등에 민간자본 유인책 마련 필요
국제기금 사업도 활용해야

◆“파리협정은 기회 요인”
이병래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사업화하는 혁신적 기술을 창출하기 위해선 기후 금융을 활성화하는 게 급선무”라며 “정부도 은행의 여신 관행과 시스템을 개선해 기후변화 대응 기술 기업에 자금이 원활하게 지원되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상임위원은 “재무제표에 의존하지 않고 기술력만 평가해 대출해주는 기술금융 활성화 정책이 2014년 7월 본격 시행된 덕분에 국내에서도 기술금융 역량이 커졌다”며 “이 같은 자원을 활용한다면 온실가스 감축 목표도 충분히 달성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 탄소배출권 주문시스템을 운영 중인 코스콤의 노희진 상임감사는 “파리협정체제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 자본이 온실가스 감축 기술에 투자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작년 12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나온 파리협정은 2020년 이후 신기후 체제에 대한 세계 각국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선진국에만 부과하던 이전 교토의정서와 달리, 개발도상국에도 감축 의무를 부과한 게 핵심 내용이다.
노 감사는 “상업 투자자를 끌어들이려면 적정 수익률과 리스크(위험)가 있어야 하는데 기후 기술은 투자기간이 길고 수익률도 불확실하며, 리스크가 크다는 특징이 있다”며 “에너지 효율화, 탄소 배출 저감, 탄소 포집 등의 기술에 정부가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중위험, 중수익률’로 기후 금융상품을 만든다면 연기금이나 보험사 등 대형 금융회사 참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수열 전남대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교수는 “기후변화 기술 개발과 탄소배출권 거래를 비용으로 여기는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이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기회를 찾고 있다”며 “정부의 기후기술 관련 연구개발(R&D) 사업에 기업가정신이 충만한 중소기업을 우선 참여시킨다면 성과가 더 잘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 마이크로그리드사업 유망”
기업들이 정부출연연구소나 국제기금 프로젝트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주현규 에너지기술연구원 대외협력정책본부장은 “국내 25개 출연연에 기후 관련 기술과 장비, 인력이 많이 있는데 활용도가 높지 않다”며 “출연연이 중소기업에 개발자금도 일부 지원하기 때문에 상생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장창선 녹색기술센터 연구원은 “소각장 등 혐오시설을 친환경 에너지 타운으로 만드는 마이크로그리드(소규모 지역 전력 자급자족시스템) 수요가 온두라스 필리핀 등 해외에서 급성장하고 있다”며 “현재 관련 컨설팅 작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더 나아가 정부 정책을 연계하고 기업까지 동반 진출하는 모델이 나왔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한철 기보 이사장은 “국내 첫 유엔 산하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CTCN)의 전문기관 승인을 받은 기보가 해외 CTCN과 연계해 개발도상국 기술 지원, 지식 공유 등의 역할을 할 것”이라며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기후기술 사업화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엘리뇨 가고 라니냐 온다…중미, 곡물 생산 차질 우려 [원자재 포커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404/01.36469281.3.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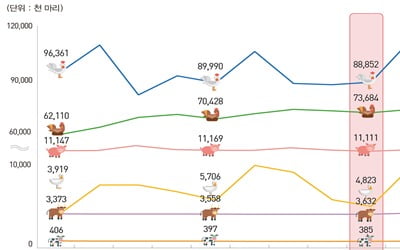


![넷플릭스, 가입자 순증 꺾였다…악재 쏟아진 기술주 [글로벌마켓 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B2024041907203332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