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형 IB 육성책 왜 나왔나…"제대로 된 투자은행 육성 목표"
선정기준을 둘러싼 논란을 줄일 장치로는 자기자본 규모에 따라 계단식으로 인센티브를 차별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 우물 안 개구리식으론 안 된다
정부는 혁신적인 기업이나 초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대출과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3년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인 증권사에 기업 신용공여 업무를 허용하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이 제도가 도입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증권사가 주축인 IB업계는 여전히 중개업 영역에 머물고 있고 제살깎아 먹기식 가격경쟁 중심의 영업방식에서 탈피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증권사의 수익 중 위탁매매가 차지하는 비중은 40~50% 이상으로, 미국(14%)과 일본(17%)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금융 규모는 2013년 말 1조1천억원에서 올해 5월 말 4조7천억원으로 증가하긴 했다.
하지만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나 인수합병(M&A) 관련 브릿지론이 대부분으로 질적인 측면에서는 미흡한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제가 활력을 회복하고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면 보수적인 금융업을 영위하는 은행과 자본력이 약한 벤처캐피탈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투자은행 중심의 종합 기업금융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다.
또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이나 M&A 등을 통한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이 늘면서 이들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대형 자본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2013년부터 올해 4월까지 국내 공기업이 시행한 해외 증권발행 64건 중 국내 증권사가 참여한 것은 10건에 불과했다.
해외 IB들이 대형화와 겸업화를 통해 덩치를 키우고 있는 추세도 금융당국이 초대형 IB 육성 방안을 서둘러 내놓게 한 배경이 됐다.
작년 말 기준으로 글로벌 투자은행인 모건 스탠리의 자기자본은 88조5천억원, 골드만 삭스는 102조1천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미래에셋증권·미래에셋대우(옛 대우증권)의 합병으로 올 11월 출범하는 국내 1위 증권사의 자기자본은 6조7천억원 수준이다.
이는 아시아권에서 12위에 불과하다.
현재 국내 자기자본 1위인 NH투자증권은 4조5천억원선으로 아시아권에서 15위에 머물고 있다.
일본을 대표하는 증권사인 노무라는 M&A를 통해 덩치를 키워 작년 말 기준 순자산(자기자본)이 통합 미래에셋증권보다 훨씬 많은 8조3천억원대다.
◇ 증권업계 몸집 불리기 경쟁 가속화될 듯
자기자본 수준별로 영위할 수 있는 사업과 인센티브가 차등화됨에 따라 증자나 M&A 등을 통한 증권사들의 규모 키우기 경쟁이 한층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된다.
이렇게 몸집을 불린 IB들이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있지만 자금력이 부족한 기업에 과감하게 투자하고 해외 대형 투자 프로젝트에도 활발하게 참여해 전체적인 국가 경제 볼륨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금융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사실 금융당국의 초대형 IB 육성책이 발표되기 전부터 증권사들은 경쟁적으로 몸집 불리기에 나섰다.
신한금융투자는 지난달 21일 이사회를 열어 5천억원대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자기자본 규모가 2조5천억원인 이 회사는 이를 통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새롭게 편입된다.
메리츠종금증권도 작년 유상증자와 아이엠투자증권 인수 등을 통해 자기자본을 1조7천억원 정도로 끌어올려 놓은 상태다.
올 3월 말 기준으로 통합 미래에셋증권과 NH투자증권을 제외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들의 자기자본은 KB와 현대증권 합병 증권사가 3조8천억원, 삼성증권은 3조4천억원, 한국투자증권은 3조2천억원 수준이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선정 기준이 4조원과 8조원으로 나뉨에 따라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등은 M&A 시장에 매물로 나온 하이투자증권 인수전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
증권업계는 각종 혜택을 받으면서 기업의 규모를 키우고 사업 영역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이 이번에 내놓은 초대형 IB 육성책을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다.
특히 현재 종합금융투자사업자들은 환매조건부채권(RP)과 주가연계증권(ELS)을 통해 모으는 자금이 전체 조달액의 73%에 달할 정도로 고비용·저효율 자금조달 구조의 제약을 받았다.
그러나 어음발행 등을 통해 상시적인 자금조달 수단을 확보하면 예금이라는 강력한 자금모집 수단을 갖고 있는 은행권을 위협하는 금융 경쟁력을 갖추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자금조달과 운용 등 양 측면에서 업무 수행을 가로막던 요인들을 대폭 완화함에 따라 자본시장의 기업금융 기능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지향점은 자기자본 10조원 이상 IB 육성
금융위는 초대형 IB에 제공할 인센티브를 자기자본 3조 이상~4조 미만, 4조 이상~8조 미만, 8조 이상 등 세 구간으로 나눠서 제시했다.
이는 궁극적으로 자기자본 10조원 이상의 거대 IB를 육성하기 위한 취지라고 금융위는 설명한다.
그러나 이번 대책이 초대형 IB 기준을 3조원으로 유지할지, 아니면 5조원으로 높일지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던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이 기준을 단순히 5조원 이상으로 높일 경우 통합 미래에셋증권만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얘기가 끊이지 않았다.
이런 배경에서 금융위는 애초 지난 6월 초대형 IB 육성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다가 연기를 거듭한 끝에 이날 대책을 내놓았다.
기존 종합금융투자사업자들은 대형 IB를 육성하겠다는 당국의 취지에 맞춰 자기자본을 겨우 3조원까지 늘려 놨는데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게 될 상황을 우려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기존 3조원 이상 사업자를 포함하면서 구간을 나누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해법을 찾았다.
정책적으로 더 많은 혜택을 보려면 통합 미래에셋증권과 NH투자증권은 자기자본을 8조원대로 불려야 한다.
또 나머지 종합금융투자사업자들은 우선 4조원대 구간에 들어가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애초 알려진 대로 자기자본 5조원 이상으로 초대형 IB 기준이 바뀌었다면 업계 반발이 상당했을 것"이라며 "자본확충에 드는 노력에 비해 구간별 인센티브 차별화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banana@yna.co.kr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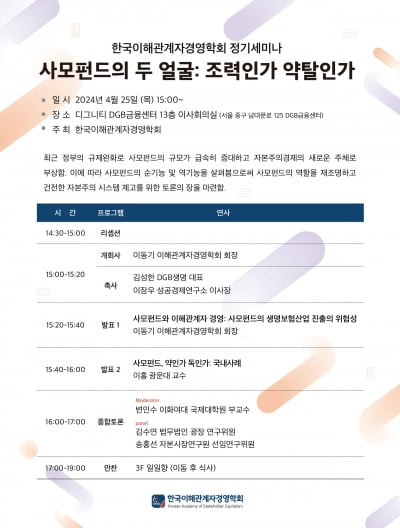












![[신간] 당뇨·심장병·암·치매 예방하기…'질병 해방'](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ZK.36525180.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