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컨트롤타워 정책본부, 검찰 칼날에 '휘청'
특히 신동빈 회장의 측근으로 분류된 이인원 정책본부장과 황각규 운영실장, 소진세 대외협력단장 등 주요 인물들은 앞으로 중심 수사선상에 올라 줄줄이 검찰 소환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그룹 정책본부는 경영 관련 주요 업무사항을 총괄하는 조직이다.
삼성의 미래전략실처럼 그룹 계열사 업무 전반을 관리하고 그룹의 비전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왔다.
운영실·지원실·비전전략실·커뮤니케이션실·인사실·개선실·비서실 등 모두 7개 실로 구성돼 있으며 임원 20여명을 포함해 약 25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검찰은 10일 압수수색 과정에서 커뮤니케이션실 홍보팀을 제외한 롯데그룹 정책본부의 모든 사무실을 샅샅이 뒤졌다.
정책본부는 단순히 그룹 계열사 업무 전반을 조율·관리하는 조직일 뿐 아니라 신동빈 회장이 한국 롯데그룹을 장악하는 데 발판이 됐고, 이 때문에 그의 최측근들이 근무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실제로 롯데는 2004년 그룹 경영관리본부를 정책본부로 확대·개편하면서 초대 정책본부장에 신동빈 당시 부회장을 임명했다.
1981년 일본 노무라증권에 입사해 일하다 1988년 일본 롯데상사로 자리를 옮긴 신 회장은 1990년 호남석유화학에 상무로 합류해 국내 경영에 본격적으로 참여했고, 2004년 정책본부장 취임을 계기로 경영 전면에 등장했다.
신동빈 회장은 정책본부장으로 6년여간 경영 수업을 해오다 2011년 2월 그룹 회장에 취임했다.
이후 정책본부에는 신동빈 회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인물들이 자리잡기 시작했다.
신동빈 회장의 뒤를 이어 2011년 정책본부장을 맡은 이인원 부회장은 당초 신격호 총괄회장의 가신으로 분류됐다.
롯데그룹 안팎에서는 신중하고 보수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신격호 총괄회장이 경영에서 한 발 뒤로 물러선 이후에도 신동빈 회장의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경영 스타일을 다소 누그러뜨리려 이 부회장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해 온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신동빈 회장과 손발을 맞추는 과정에서 이인원 부회장은 20년 이상 그룹 핵심부에서 일해온 경험을 높게 평가받았고, 지난해 경영권 분쟁 이후에는 완전히 신동빈 회장 측 인물로 분류됐다.
정책본부의 핵심 조직 가운데 하나인 운영실은 그룹 계열사의 경영기획·실적 등을 관리하고 조율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이 운영실을 이끄는 황각규 사장 역시 신동빈 회장의 '측근 중의 측근'으로 통한다.
신동빈 회장이 1990년 한국으로 건너와 호남석유화학에서 경영자 수업을 받을 당시부터 함께 일했기 때문이다.
롯데그룹에서 인수·합병(M&A) 문제를 맡아온 전략가인 황 사장은 경영권 분쟁 당시에도 신동빈 회장의 '두뇌' 역할을 했으며, 이후 발표된 지배구조 개선안 역시 상당 부분 황 사장의 손을 거친 것으로 전해졌다.
대외협력단 커뮤니케이션실을 이끄는 소진세 사장은 2014년 롯데슈퍼 사장을 끝으로 사실상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가 같은 해 대외협력단장으로 복귀했다.
부분 개장을 앞둔 제2롯데월드의 안전사고와 롯데홈쇼핑 비리 문제로 그룹이 어려움에 빠지자 신동빈 회장이 그룹 이미지 개선과 홍보·대관 업무 강화를 위해 소 사장을 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함께 검찰은 그룹의 그룹 재무와 법무를 담당하는 지원팀도 주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압수수색을 끝내자마자 자금관리담당 임원 이모 씨 등 3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것도 '금고지기' 역할을 해온 이들이 이번 수사의 중요한 단서를 쥐고 있을 것으로 분석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검찰이 단순한 단일 사업비리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신동빈 회장을 중심으로 한 비자금 조성 등 그룹의 전반적인 비리를 타깃으로 하는 만큼 압수물 분석과 실무자 소환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바로 곧바로 '가신 3인방' 등 정책본부 주요 인물에 대한 소환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cindy@yna.co.kr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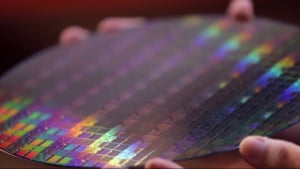
!["갈 길 멀지만…" 2년 만에 활짝 웃은 기재부 경제정책국 [관가 포커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404/01.36523223.3.jpg)



!['매그니피센트7' 실적 먹구름…지수 혼조 [뉴욕증시 브리핑]](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01.36519299.1.jpg)








![살인과 고문조차 서슴치 않았던 폐륜의 과학자와 의사들 [서평]](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01.36520524.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