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알리안츠 쇼크, 보험산업에 무슨 일이…
알리안츠는 지난해 870억원의 손실을 냈다. 그러나 35억원은 16조원의 자산규모와 국내 11위 생명보험사라는 점을 고려하면 놀랄 정도의 헐값이다. 몇몇 PEF(사모펀드)가 2000억원 넘는 매수가를 제시했는데도 알리안츠는 ‘대주주 적격심사’ 통과에 유리한 안방을 택했다는 풍문도 있다. 야반도주하듯 ‘탈(脫)한국’을 서둘러야 할 이유라도 있는 것일까.
‘보험산업의 위기’라는 말이 회자된 지 벌써 10여년이다. 끝 모를 저금리에 보험자산을 굴릴 곳은 여의치 않다. 과거 고금리시절 판매한 연 7% 이상의 확정금리 상품만도 보험업계 전체로 92조원이다. 반면 운용자산수익률은 기껏 3%대이니 역마진은 구조적이다. 보험사들은 보유채권을 내다파는 등의 편법으로 역마진을 메워가는 중이다. 장부가로 기재된 ‘만기보유증권’을 시가평가하는 ‘매도가능증권’으로 슬며시 재분류하는 꼼수도 동원했다.
가장 큰 골칫거리는 국제회계기준(IFRS) 적용시점이 시한폭탄처럼 다가온다는 점이다. 2020년 개정된 IFRS가 시행되면 부채도 시가로 평가해야 한다. 이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보험회사들이 확충해야 하는 자본금이 무려 42조원에 달할 것이란 분석도 있다. 이런 위험들이 지금 보험사들의 장기적 경영전망에 짙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 것이다.
보험업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알리안츠는 떠나면 그만이다. 보험사 경영진과 금융당국자들은 내 임기 동안은 괜찮을 거라며 안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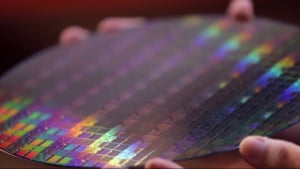
!["갈 길 멀지만…" 2년 만에 활짝 웃은 기재부 경제정책국 [관가 포커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404/01.36523223.3.jpg)












![살인과 고문조차 서슴치 않았던 폐륜의 과학자와 의사들 [서평]](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01.36520524.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