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투자위험' 분기마다 의무공시
금융감독원은 유상증자 등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에만 기재하도록 돼 있는 회사의 위험 요인을 분기·반기·사업보고서에도 적는 방안을 올해 중점과제로 추진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이를 위해 기업이 공개해야 할 위험 항목을 나열한 작성 지침을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
기업들 "비용부담·소송 리스크 커질 것"
공시 지침이 달라지면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상장사 1195개와 증권 발행 실적이 있는 (혹은 자산 규모가 125억원 이상이면서 주주가 500인 이상인) 비상장회사 등 정기보고서 제출 대상 2474곳(2015년 말 기준)은 앞으로 회사에 발생할지 모르는 잠재적인 위험 요인을 분기마다 빠짐없이 공시해야 한다.
금감원의 이 같은 움직임은 정기보고서만 제출하는 기업들에 대한 투자자 보호가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정기보고서에도 위험 요인을 기재하기는 하지만 증권신고서에 비해 지나치게 양이 적고 구체적이지도 않다는 것이다. 미국과 영국 등 주요 선진국도 증권신고서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구체적인 투자 위험을 정기보고서에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계는 이 같은 공시지침 변경이 달갑지 않다는 반응이다. 한 상장사 공시담당자는 “증권신고서가 요구하는 까다로운 공시의무를 피하기 위해 비싼 금리를 주더라도 사모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기업들도 많다”며 “상장사가 증권사에 상당한 수수료를 주고 기재하는 투자 위험을 분기마다 작성하려면 경비 부담이나 소송 리스크가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 증권시장에서 주식이나 채권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출하는 증권신고서에는 매우 높은 수준의 공시의무가 요구된다. 사업 위험, 회사 위험, 기타 위험 등으로 위험을 분류해 ‘속해 있는 산업과 업종 및 영업의 특성에 따른 위험’, ‘재무상태 지배구조 등 회사의 특수한 위험’을 서술해야 한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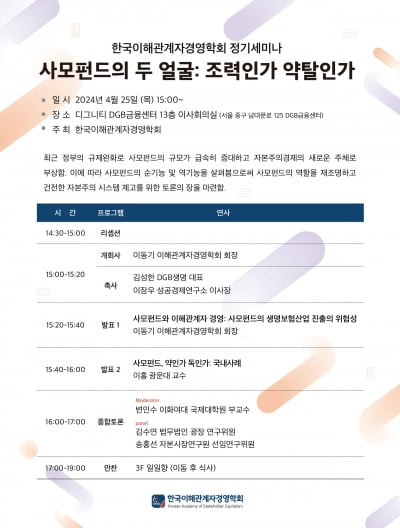

![판매량 줄어도 매출 늘어난 현대차…"비싼차 많이 팔았다" [종합]](https://img.hankyung.com/photo/202404/02.33262402.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