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몰하는 자영업 탈출구를 찾아라] 간이과세 기준 4800만원 20여년前과 똑같아
"부가세 내면 남는게 없어요"
자영업계, 기준 상향 요구에
정부 "과세 양성화 역행" 반대
![[침몰하는 자영업 탈출구를 찾아라] 간이과세 기준 4800만원 20여년前과 똑같아](https://img.hankyung.com/photo/201409/01.9131118.1.jpg)
대전 선화동에서 칼국수집을 운영하는 박모씨는 1년에 두 번 부가세를 낼 때마다 울화통이 터진다고 했다. 한때는 월매출이 1000만원을 넘기도 했지만 요즘엔 월 600만원도 올리기가 쉽지 않아서다. 충남도청이 2012년 내포신도시로 이전하면서 상권이 급격히 쇠퇴한 탓이다.
박씨는 “매출의 10%가량을 부가세로 내고, 2%가량을 카드 수수료로 내면 손에 쥐는 게 거의 없다”며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 영세 자영업자 기준이 20여년 전과 달라진 게 없다”고 하소연했다.
정부는 영세 사업자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제를 도입하고 있다. 간이과세는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의 사업자에 한해 부가세를 대폭 낮춰주고,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부가세 신고를 연 1회로 줄여주고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면제해주는 행정 편의까지 제공하는 일종의 특례제도다.
간이과세자 중 연매출이 2400만원 미만일 경우 부가세가 완전히 면제된다. 연매출 7000만원을 올리는 박씨는 일반과세자로 분류돼 혜택 대상이 아니다.
자영업자들은 간이과세 기준이 19년 전과 똑같다고 불만이다. 간이과세 기준 금액이 연매출 36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오른 게 1995년 일이다. 외환위기 때였던 1996년에는 1억5000만원까지 대폭 높아졌다가 2000년 다시 4800만원으로 내려 14년째 그대로다.
장사 경력 5년째인 서울 도봉구의 한 음식점 주인은 “지난 20여년간 물가 상승을 감안하지 않고 월매출 400만원 수준에 불과한 간이과세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과거와 달리 손님 대부분이 한 끼 4000원짜리 식사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시대에 너무한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간이과세 기준은 정치권에서도 관심이 높은 이슈다.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은 간이과세 기준 금액이 선진국과 비교할 때 터무니없이 낮다며 기준 금액을 48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이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2012년 발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는 간이과세 이슈가 제기될 때마다 과세자료 양성화에 역행한다면서 강력 저지해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간이과세 기준을 높이면 세금계산서 거래가 크게 줄어 지하경제를 더 키울 수 있다”며 “국제기구나 시민단체는 오히려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한국의 간이과세제를 조속히 폐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취임 이후 간이과세제를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지난주 발표한 자영업자 대책에 포함시키지 못했다. 박근혜 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 기조와 배치된다는 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
조진형/김동현/고은이 기자 u2@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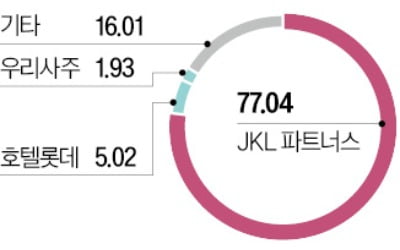












![MBC '뉴스데스크' 앵커 출신 박혜진, 파격 근황 봤더니 [이일내일]](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01.36513659.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