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관·화평법 이어…이번엔 '환통법'
1월 말 입법 예고…산업계 "비용 증가"
최상의 기술 잣대로 규제…5년마다 재허가

업종과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해 사업장별로 오염물질 배출허가 기준을 정해주는 방식이다. 정부는 2016년 발전 소각 등 2개 업종, 2017년에 철강 등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2020년부터 석유화학 등 20개 업종의 대규모 사업장에 통합허가관리제도를 적용할 계획이다.
기업들은 허가를 통합하면 중복 규제 해소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비용 부담 증가 등 부작용이 클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사업장별 통합허가관리제도는 최상가용기술(BAT)을 사용해 환경오염시설을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상가용기술은 현재 해당 업계에서 사용 중인 기술 가운데 환경성과 경제성이 가장 우수한 기술을 말한다.
최상가용기술을 기준으로 규제하면 첨단 기술을 갖춘 일부 대기업을 제외한 대부분 중소·중견기업은 추가 비용 발생이 불가피하다.
화학업체 관계자는 “오염배출 정도를 가장 높은 수준의 기술을 기준으로 삼아 규제하는 것이 새 제도의 대표적인 문제점”이라며 “고도의 기술을 갖춘 글로벌 기업이나 대기업 이외의 기업은 비용 부담을 크게 느낄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한 차례 허가만 받으면 되는 것을 5년마다 의무적으로 갱신하도록 규정한 조항도 논란거리다. 오염물질 누출 등 사고를 내지 않은 기업도 정기적으로 다시 허가를 받는 것은 과잉 규제라는 지적이다.
섬유회사 관계자는 “5년마다 허가를 받으면 갱신 시점에서 최신 기술에 맞춘 최상가용기술 수준을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허가 갱신 시점에 맞춰 또다시 첨단 설비를 도입해야 하는 등 부담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환통법으로 허가받은 이후 운영 관리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된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환경오염시설은 통합 허가를 받지만 대기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악취관리법 등 기존 개별 환경법의 규제도 여전히 받아야 하기 때문에 기업으로선 중복 관리 비용이 상당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기업에 적용할 최상가용기술 수준을 산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반영할 계획”이라며 “5년 마다 허가를 재검토해도 적정 수준에서 관리하고 있다면 설비를 추가로 도입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또 “현재 확정된 적용 대상은 대형 사업장 위주로 전체 사업장의 1.3%인 1300여개 수준으로 중소·중견 기업은 추후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배석준/김주완 기자 eulius@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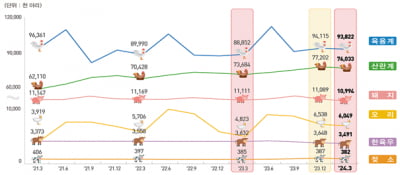




![넷플릭스, 가입자 순증 꺾였다…악재 쏟아진 기술주 [글로벌마켓 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B20240419072033320.jpg)








![[신간] 휠체어를 탄 여성들…'우리의 활보는 사치가 아니야'](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ZK.36468973.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