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프랜차이즈 CEO]피자헤븐 "업계 최초 18인치 대형 피자 전략 먹혔죠"…배곯던 배달부에서 매장 40개 사장된 사연
![[2030 프랜차이즈 CEO]피자헤븐 "업계 최초 18인치 대형 피자 전략 먹혔죠"…배곯던 배달부에서 매장 40개 사장된 사연](https://img.hankyung.com/photo/201308/01.7760768.1.jpg)
업계 최초 18인치 대형 피자 전략…입소문 타고 월 매출 3000만 원까지
20년 전 한 고등학생은 생활비를 벌기 위해 피자 배달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16m²(5평) 짜리 조그만 방에서 여섯 식구가 누워야 할 정도로 집안 살림은 빠듯했다. 그 당시 공부보단 먹고사는 게 급급해 이른 나이에 생업에 뛰어들었다던 최광준 씨(39·사진)는 현재 전국 40여 곳에 프랜차이즈 피자 전문점을 연 '피자헤븐' 대표다.
"첫 피자 가게에 취업해서 배달도 열심히 했지만 직접 피자도 만들면서 즐거웠어요. 그 모습을 눈여겨 보던 가게 사장님도 저를 좋게 보셨어요. 왜냐하면 배달 아르바이트생들은 대부분 오토바이에 더 많은 관심을 쏟았거든요. 사장님께 피자 만드는 법을 제대로 배운 뒤 배달에서 주방으로 보직을 변경했습니다."
그의 첫 사업 시도는 의도하지 않게 찾아왔다. 평소 심장 질환을 앓던 아버지가 퇴직을 결정하게 되면서다. 당시 갓 스무살을 넘긴 최 대표는 일찍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만 했다. 그는 아버지의 퇴직금은 물론 어머니가 운영하시던 과일가게와 유일한 재산이던 살던 집까지 정리해 피자 가맹점 하나를 열었다.
"어렵게 피자 가맹점을 열고 직접 운영했던 그간 경험이 이제와서 피자헤븐의 가맹점주들을 이해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어요.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해 저 혼자 피자를 만드는 일부터 배달까지 도맡아 했으니까요. 당시엔 힘이 부쳤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피자 가게 한 곳을 운영하기 위해 해야하는 대부분의 일을 해봤던 것이 큰 자산이 됐습니다."
피자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30대 중반이 된 최 대표는 2008년, 직접 피자 사업에 뛰어들기로 결심했다. 대기업 프랜차이즈 간판 아래서 안정적으로 피자 가맹점을 운영할 수도 있었지만 '가맹점주보다 가맹본부의 이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본사의 경영 방침'을 납득하기 어려웠다는 것. 이것이 최 대표의 창업 계기다.
최 대표는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피자헤븐 첫 매장을 내고 영업을 시작했다. 유동인구가 많았던 지역이라 생각보다 빨리 입소문이 났다. 피자헤븐의 경쟁력은 국내 최초로 모든 피자를 18인치로 만드는 '대형 피자' 전략이다. 소비자들이 흔히 볼 수 있는 피자는 15인치. 최 대표는 가격은 15인치 대로 유지하면서 크기를 키워 기존에 없던 상품으로 고객에게 다가간 점이 주효했다고 평가했다.
"큰 피자가 우리 회사의 강점이었어요. 전 메뉴를 18인치로 만든 건 저희가 최초였고요. 또 피자가 배달 위주의 음식이다 보니 영업에서도 차별화에 신경을 썼어요. 단순히 피자를 건네주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객에게 즐거움을 주려고 했습니다. 여자 대학교에서 주문이 들어오면 인형 탈을 쓰고 배달을 나가기도 했습니다. 소비자의 기억에 남도록 노력한 점이 어필한 것 같아요. 입소문이 금방 났고 지인들로부터 가맹 문의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현재 40개인 매장 수를 내년까지 60개로 늘리겠다는 목표다. 최근 18인치 피자에 이어 1인 가구를 겨냥한 8인치 피자도 회사의 간판 상품으로 키울 계획이다.
피자 배달 아르바이트생에서 매장 수 40개의 프랜차이즈 대표로 변신한 그는 2030 예비 창업인들에게 "젊을수록 머리보단 발을 써야한다"고 조언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은 매우 똑똑한 것 같아요. 어떤 아이템이 잘 되고 안 될지 영리하게 꿰뚫죠. 근데 직접 창업을 해서 가게를 운영하는 건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머리를 너무 쓰면 몸이 게을러지고 곧바로 고객들이 알아채요. 직접 발로 뛰면서 배운 것만이 자기 노하우로 쌓이는 겁니다."
한경닷컴 노정동 기자 dong2@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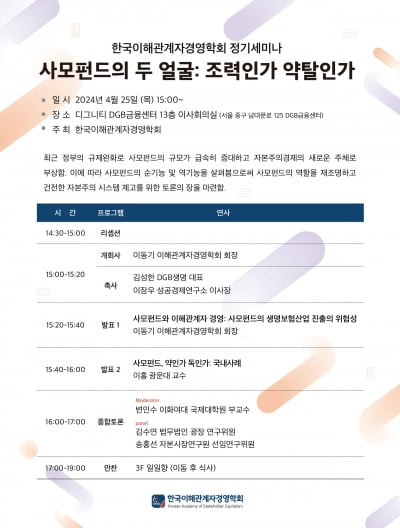

![판매량 줄어도 매출 늘어난 현대차…"비싼차 많이 팔았다" [종합]](https://img.hankyung.com/photo/202404/02.33262402.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