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총재 그들은 누구] 시간 흐르며 변한 FRB 의장 평가
'저금리' 그린스펀 천당서 지옥行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에 대한 평가는 재임 기간과 퇴임 이후 엇갈리는 경우가 많았다. 대표적 인물이 폴 볼커(재임기간 1979~1987년)와 앨런 그린스펀(1987~2006년) 전(前) 의장이다.
올해 초 상업 · 투자은행 업무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볼커 룰'을 들고 화려하게 복귀한 볼커 전 의장(현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의장)은 재임 당시 '인플레이션 파이터'로 명성을 떨쳤다. 그는 1981년 13.5%에 이르던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율(물가상승률)을 1983년 3.2%로 떨어뜨리는 데 성공했다. 임명 당시 11.2%였던 기준금리를 1981년 연 20%까지 끌어올린 '초긴축 정책'이 무기였다.
그러나 이런 정책은 1980년대 초반 미국 경기를 침체시키는 후유증을 낳았다. 생산성이 낮은 기업들의 파산이 잇따랐고 실업률은 10%까지 치솟았다. 고금리에 격분한 농민과 건축업자들은 FRB 건물 앞에서 연일 시위를 벌였다.
의회 및 백악관과의 마찰도 잇따랐다. 1980년 대통령 선거에서 지미 카터 대통령이 로널드 레이건 공화당 후보에게 패하자 한 참모는 "볼커는 인플레이션의 숨통을 끊었지만 카터 정권의 숨통도 함께 끊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 생산성이 낮은 기업들을 과감히 정리한 덕분에 이후 미국 경제가 장기 호황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반면 볼커의 뒤를 이어 FRB 의장이 된 그린스펀 전 의장은 재임 기간 '마에스트로''경제 대통령' 등 온갖 찬사를 들었지만,퇴임 뒤에는 뒤통수가 매우 따가운 처지가 됐다. 재직 중 그는 '선제적 통화정책'을 통해 급격한 경기 변동을 예방하고 고성장과 저물가의 '골디락스(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알맞은 상태) 경제'를 현실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그의 '모호한' 화법은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기 위해 중앙은행장들이 배워야 할 벤치마킹 대상으로도 여겨졌다.
그러나 2007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가 불거지자 상황이 급변했다. 전 세계가 금융위기와 경기침체로 고통받자 그를 '경제위기의 주범'으로 비난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그린스펀 전 의장이 저금리를 지나치게 오래 유지함으로써 경쟁력이 없는 기업들이 온존하고 자산 가격이 급등하는 '거품 경제'를 잉태시켰다는 것이다.
그린스펀은 2000년 정보기술(IT) 산업 붕괴로 미국 경제가 어려움에 빠지자 지속적인 금리 인하를 통해 2003년 6월 기준금리를 연 1%까지 내렸고 이를 1년간이나 유지했다.
벤 버냉키 현 FRB 의장의 시대적 역할은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이다. 일단은 제로금리 정책과 막대한 유동성 공급을 통해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또한 어떠한 평가를 받을지는 미지수다.
박성완 기자 psw@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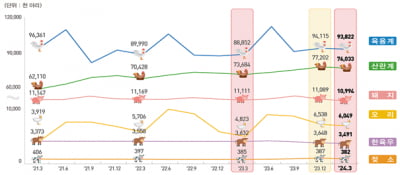




![넷플릭스, 가입자 순증 꺾였다…악재 쏟아진 기술주 [글로벌마켓 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B2024041907203332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