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은행채에 지급준비제도 적용해야"
은행들의 주요 자금조달 수단인 은행채권에 지급준비의무를 부과해 차입 규모를 규제하는 문제를 두고 찬반 논란이 거세다.
한국은행 임호열 조사국 수석부국장은 25일 은행법학회 학술세미나 제출 자료에서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은행채에도 지급준비제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급준비제도는 은행들이 비상시를 대비해 한국은행에 예금의 일정 비율을 떼어 맡겨두는 제도다.
이 비율은 정기예ㆍ적금과 대고객 양도성예금증서(CD) 등에 2.0%, 요구불예금과 수시입출금식예금 등에 7.0%가 각각 적용되고 있다.
임 부국장은 "은행들이 외형 경쟁을 위해 은행채 발행을 크게 늘린 탓에 금융불안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은행채 발행 규모가 2003년말 57조 원에서 2007년 말 121조 원으로 2배 넘게 증가함에 따라 예대율(예금 대비 대출 비율)이 94%에서 124%로 급상승하면서 금융시스템이 취약해졌다는 것이다.
그는 "현행 한국은행법은 60년 전 상황만 반영해 예금만 지급준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지정하는 채권'으로 바꿔야 한다"며 최근 논의되고 있는 한은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러한 한은법 개정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특히 은행권에서는 제2금융권과 형평성이 맞지 않고, 궁극적으로 고객들이 부담을 떠안게 것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임 부국장의 주장에 대해 한국금융연구원 이병윤 금융기관경영연구실장은 "은행채는 만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측 불가능한 인출에 대응할 필요가 작다"며 "은행채에 지급준비의무를 부과하는 게 고객을 보호한다는 주장은 명분이 없다"고 맞섰다.
이 실장은 "대출 관행을 고려할 때 은행채에 지급준비의무를 부과하면 은행들의 자금조달 비용을 늘릴 것"이라며 "이는 시장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연체율을 높이고 은행의 건전성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zheng@yna.co.kr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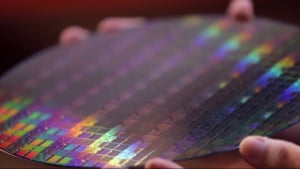
!["갈 길 멀지만…" 2년 만에 활짝 웃은 기재부 경제정책국 [관가 포커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404/01.36523223.3.jpg)



!['매그니피센트7' 실적 먹구름…지수 혼조 [뉴욕증시 브리핑]](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01.36519299.1.jpg)








![살인과 고문조차 서슴치 않았던 폐륜의 과학자와 의사들 [서평]](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01.36520524.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