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휘발유값 급등으로 경기회복 위협
작년 금융위기 이후 경기침체가 가속화하는 가운데 휘발유값이 크게 떨어져 가계사정이 어려워진 소비자들에게 그나마 위안이 됐었지만 몇달 만에 상황이 바뀐 것이다.
뉴욕타임스(NYT)는 9일 휘발유값 부담이 덜어진지 겨우 몇달만에 싼 값의 휘발유가 사라지고 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현재 미국의 평균 휘발유 판매가는 갤런당 2.62달러에 달하고 있다.
이는 작년말에 갤런당 1.62달러에 비하면 가격으로는 1달러, 상승률로는 62% 정도 오른 것이다.
특히 실업률이 12.9%로 미국내 최고인 미시간주 같이 경기침체로 곤란을 겪고 있는 중서부 지역이 고유가 타격을 더 받고 있다.
미시간주의 휘발유 평균값은 갤런당 2.93달러에 이르고 있다.
휘발유 값 상승은 미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를 기준으로 한 국제유가가 작년말 배럴당 44.60달러에서 현재는 배럴당 70달러 정도로 56% 가량 오른데 따른 것이다.
유가 상승은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미 달러화 가치 하락, 산유국의 공급 축소 속에 투자금이 원유 등 원자재에 몰리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원인이 무엇이던 간에 유가 상승은 미국 소비자들의 휘발유 값 지출 부담을 늘려 의류나 전자제품 등 완만한 경기회복에 필요한 소비지출을 줄이도록 위협하는 상황이 됐다.
전문가들은 휘발유 값이 갤런당 4달러를 넘기도 했던 작년 여름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지만 소비위축과 인플레이션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갈수록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예일대 로버트 쉴러 교수는 휘발유값 상승이 모든 사람에게 타격이 되고 심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휘발유 값 상승에 따른 부담 증가분이 미 정부의 경기부양책으로 근로자들이 올해 받게 되는 감세 혜택에서 400~500달러를 상쇄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유가정보 서비스의 톰 클로자 수석 애널리스트는 미국의 소비자들이 자동차를 주유하는데 쓴 돈이 작년 여름에 하루 15억달러에 달했다가 올해 1월에는 유가 급락과 함께 6억달러로 줄었지만 지금은 다시 10억달러에 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욕연합뉴스) 김현준 특파원 june@yna.co.kr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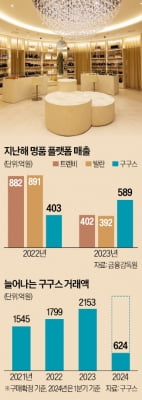







![[단독] 20代 사기범죄율 1위, 대한민국](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AA.36494722.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