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봄기운 감도는데…영국은 아직 한겨울
3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나라빚 GDP의 40%로
금융산업에 지나친 의존 충격 더 커…디폴트 우려도
세계 금융중심지 '시티 오브 런던'의 상징성을 감안,런던에서 이달 초 열린 G20 정상회의는 브라운 총리의 외교 · 정치력을 과시하고 내년 총선 표심을 다지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영국 국민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에 사상 최대 실업률,눈덩이처럼 불어난 재정적자,파운드화 가치 하락으로 또다시 39억달러의 구제금융을 받은 1976년처럼 국제통화기금(IMF)의 신세를 질지도 모를 위기에 봉착했기 때문이다.
◆무너지는 금융공룡
최근 미국 중국 등에서 경기 바닥 신호가 감지되는 것과 달리 영국은 성장률 고용 생산 소비 등 거의 모든 지표가 여전히 한겨울이다. 영국 국립경제사회조사원(NIESR)은 올 1분기 성장률이 -1.5%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작년 3분기(-0.7%)와 4분기(-1.6%)에 이어 3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다.
NIESR는 영국의 성장률 둔화가 노조 파업이 피크였던 1979년과 흡사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올해 영국 성장률이 -3.7%로 추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작년 11월부터 올 1월까지 평균 실업률은 6.5%로 치솟았다. 블룸버그통신은 최근 영국의 실업이 30년래 최고 속도로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제조업과 건설 경기도 얼어붙었다. 작년 4분기 건설 경기는 4.9% 하락했고,경기침체로 국민들이 지갑을 닫으면서 소비도 1% 줄었다.
특히 지나치게 금융에 의존적인 산업구조는 영국의 경제난을 심화시킨 주범으로 지적된다. 헤지펀드업계 대부인 조지 소로스는 최근 "영국 경제는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고 금융산업에 지나치게 의존해 부동산 버블 붕괴의 충격이 심하다"며 "금융산업이 무너질 경우 IMF 구제금융 신청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지난 15년간 영국은 파생상품,헤지펀드 등 국제 금융시장의 30%를 장악한 금융산업에 힘입어 2007년까지 연 3%대의 고속성장을 구가했다. 1980년대 후반 경쟁력 없는 제조업을 정리하는 대신 규제 완화를 통해 금융 부문을 키운 마거릿 대처 전 총리의 '금융빅뱅'을 통해 영국의 금융산업은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8% 규모로 비대해졌다.
하지만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런던 금융가에선 은행 부문 손실과 파운드화 폭락으로 2조파운드(약 2조9000억달러)의 자산이 증발했다. 또 집값 거품 붕괴로 금융권의 모기지(주택담보대출) 등 부실자산 규모가 GDP의 6.4%인 925억파운드로 불어났다.
경제의 버팀목인 금융이 무너지면서 신용경색→경기침체→실업→소비 위축의 악순환은 점점 더 깊어졌다. 블룸버그는 런던 금융산업 붕괴로 2011년까지 추가로 29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곳간은 비고 정책 약발은 실종
다급한 영국 정부는 작년 10월부터 기준금리를 연 5%에서 0.5%로 6개월 연속 내리고,지난달에는 국채를 매입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양적완화' 정책을 꺼내들었지만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평가다. 소비와 투자는 되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요지부동이다.
부실 금융사에 대규모 구제금융을 지원하면서 정부 재정적자는 GDP의 11%,국가 부채는 GDP의 40%로 불어났다. 일각에선 영국의 국가부채가 조만간 GDP의 80%로 늘어나 채무불이행(디폴트) 상황에 놓일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한다.
22일 올해 예산안 발표를 앞둔 영국 재무부는 딜레마에 빠졌다. 금융권을 포함한 경제 살리기를 위해선 천문학적인 재원이 필요하지만 '곳간'은 비었다. 실업과 경기침체가 최고조에 이르렀지만 세수확대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김미희 기자 iciici@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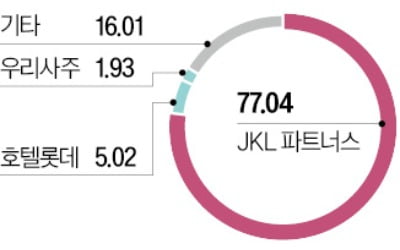












![스타급 앵커 박혜진 파격 근황 "출판사 사장님 됐어요" [이일내일]](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01.36513659.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