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 꿈' 접는 연구원들 작년 기술창업 4명 뿐
23일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에 따르면 정부출연연구소의 연구원들이 회사를 설립한 연구원 창업이 2001년 56명을 정점으로 8년 동안 급격히 감소해 2008년에는 단 4명의 연구원들만이 창업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연구회 소속의 정규직 연구원이 7300여명인 만큼 전체의 0.05%만 창업에 나선 것이다. 금융위기가 닥쳤던 1997년에도 10명의 연구원이 창업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연구원들의 창업 의지가 바닥 수준으로 떨어진 셈이다.
교육과학기술부 산하의 기초기술연구회에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등 13개 출연연구소가 소속돼 있으며 지식경제부 산하의 산업기술연구회에는 전자통신연구소(ETRI)를 포함해 13개 출연연구소가 속해 있다. 2000년에는 KIST에서만 12명,생명공학연구원에서 13명의 연구원이 창업했지만 2001년 이후에는 단 한 건의 연구원 창업도 나오지 않았다. 우리나라를 정보통신 강국으로 이끌어온 주역인 ETRI 역시 1998년 17명,1999년 10명,2000년 16명을 기록하는 등 1995년 이후 총 56명이 사업에 나섰으나 2002년부터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들의 창업의지가 이처럼 시든 것은 △경기 침체에 따른 자금조달의 어려움 △정부의 제도적 지원 후퇴 △동료연구원들의 창업실패를 목격한 학습효과 △기술인들의 경영능력 부재 등의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문제는 연구원 창업이 위축되면 리스크가 크거나 아직 시장이 형성되지 않아 기업들에 이전하기 힘든 첨단기술들이 사장될 수 있다는 점이다. 노환진 교과부 연구기관지원과장은 "기술이 일단 기업으로 넘어간 뒤에는 개발자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시키기 힘들어 이전하는 사람과 받은 기업 사이에 간극이 생길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ETRI 출신 벤처인들 모임인 EVA의 회장을 맡고 있는 임연호 티에스온넷 대표는 "다산다사(多産多死)가 벤처기업의 특성인데도 부정적인 모습만 부각되면서 기술창업의 근간이 무너지고 있어 안타깝다"며 "벤처기업은 고용창출 효과가 클 뿐만 아니라 젊은 연구자들이 사업 현장에서 실무를 배울 수 있는 만큼 정부의 효율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황경남 기자 knhwang@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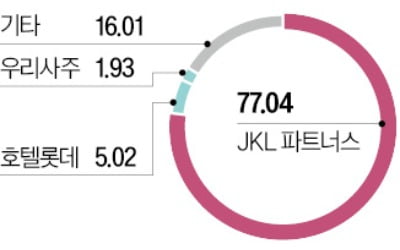











![MBC '뉴스데스크' 앵커 출신 박혜진, 파격 근황 봤더니 [이일내일]](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01.36513659.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