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선장 맞은 포스코 제1과제는 '위기 탈출'
포스코의 최고경영자(CEO) 교체 작업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면서 시장의 관심은 '포스트 이구택 체제'가 풀어야 할 과제로 모아지고 있다. 포스코가 맞닥뜨린 내 · 외부의 도전이 그 어느 때보다 거세기 때문이다. 사상 처음 포스코가 감산에 나설 정도로 철강시장은 위기에 봉착해 있고 해외 자원 확보라는 지상 과제는 여전히 속시원한 해법을 찾지 못한 상태다.
◆'감산과의 전쟁' 해법 찾아라
철강 시장은 최근 들어 극심한 침체에 빠졌다. 아르셀로미탈과 신일본제철 등 세계 정상급 제철소들이 잇달아 고로의 불을 끌 정도로 수요가 급감했다. 감산은 이제 더 이상 뉴스가 아닐 정도다. 세계에서 불황에 대한 내성이 가장 강한 철강회사로 꼽히던 포스코마저 작년 12월부터 생산량을 줄였다. 이런 감산 기조는 최소한 올 1분기 내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올해 전 세계 조강 생산량은 11억5000만t으로 작년(13억3000만t)에 비해 2억t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위기의 해법은 우선적으로 제철소 현장에서 찾아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진단이다. 철강회사는 자동차와 전자 등 다른 업종과 달리 '생산' 중심의 조직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원가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두 축으로 수요 감소에 대응하는 전략을 짜는 게 급선무"라며 "여기에 제품 구성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판매처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M&A · 원료 자급률 확대 등 관건
포스코는 앞으로 10년 뒤인 2018년의 매출 목표(연결 기준)를 100조원으로 잡았다. 작년 매출액(31조9000억원)의 세 배가 넘는 규모다. 늘 해오던 방식으로는 달성하기 힘든 목표다. 포스코가 작년 한 해 동안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정성을 쏟은 것도 이 때문이다. 조선업과 철강업 간 시너지 효과를 높여 신성장 동력을 빚어내겠다는 큰 그림을 그렸지만 무산됐다.
신임 회장에게 주어질 최대 과제 중 하나도 중 · 장기 성장전략 수립이다. 기업 인수 · 합병(M&A)은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표적인 수단이다. 다행히 포스코는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다. 공격적인 확장 전략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아르셀로미탈 등에 비해 자금 여력이 크다. 몸집을 확 불릴 수 있는 호기다. 작년 말 기준 포스코의 조강 생산량은 3200만t 수준.반면 아르셀로미탈은 1억t을 훌쩍 넘는다. 최근엔 후발 주자들의 추격도 거세다. 중국의 바오산강철은 조강 생산량 8000만t을 목표로 공격적인 설비 증설에 나서고 있다.
해외 자원 확보도 풀어야 할 숙제다. 호주 등 일부 지역에 한정된 자원 개발 전략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포스코의 작년 말 기준 원료 자급률은 20% 수준인 데 비해 세계 1위 철강업체인 아르셀로미탈의 자급률은 50%에 육박한다. 아르셀로미탈은 2012년까지 50억달러를 쏟아부어 자급률을 70%까지 늘린다는 계획도 세워놓고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포스코가 사업 구조를 다각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는 원자재 자급률을 높이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GE식 전문경영인 승계체제 갖출까
신임 포스코 회장의 임기는 일단 이구택 회장의 잔여 임기인 내년 2월까지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1년 뒤 또 한 차례 CEO 연임 여부를 놓고 조직이 흔들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포스코 내부에서는 이런 점을 걱정하고 있지만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외풍'에 약한 포스코의 체질을 강화하기 위해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CEO 승계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미리 후계자를 키우고 가시화해 회장이 바뀔 때마다 불거지는 '외압설'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포스코의 한 사외이사는 "포스코는 외풍에 대한 걱정 때문에 유 · 무형의 불필요한 손실이 적지 않다"며 "미국의 GE처럼 탄탄한 CEO 승계 프로그램이 뿌리를 내려야만 이런 폐단을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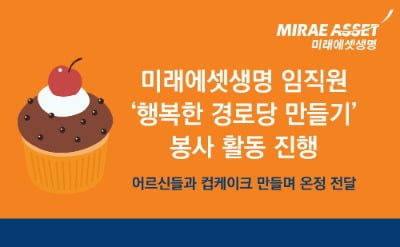







![[단독]하이브 키운 '멀티 레이블'이 제 발등 찍었다](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02.33877838.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