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4 10:32
수정2006.04.04 10:34
현대 경영권 분쟁이 법정싸움으로 비화된가운데 현대엘리베이터의 대주주로 올라선 정상영 KCC 명예회장과 기존 대주주인 김문희(고 정몽헌 회장의 장모) 여사가 결국 대충돌했다.
정명예회장은 20일 발표자료를 통해 지분 매입과정의 비도덕성을 비난한 김문희여사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격했으며 이에대해 김여사는 `말도 안되는 주장'이라며 역공을 가하는 등 양측의 신경전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이처럼 현대 경영권 다툼이 법정공방과 감정싸움 등으로 극한을 치닫고 있는 가운데 양측이 서로 다른 주장을 펴며 `진실게임'을 벌이고 있어 진위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 명예회장, 전면에 나서나 = 그동안 직접적인 입장표명을 자제해온 정명예회장이 `정상영 KCC 명예회장의 심경'이라는 글을 통해 이례적으로 전면에 나선 것은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알려 그룹 `접수'에 대한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삼촌이 상(喪)중에 주식을 매집, 조카 그룹을 통째로 삼겼다'는 등의 도덕적비난이 적지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현정은 회장측의 국민주 공모를 통한 유상증자가 성사되면 대주주로서의 입지가 사실상 무너지는 등 악재가 겹쳐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대북사업 지속추진 방침과 국민주 공모의 문제점 등을 밝힘으로써 대주주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다시 한번 표명하기 위한 것으로도풀이된다.
그는 "대북사업은 대북문제 전문가인 김윤규 사장과 협의해 적절하게 운영해 나갈 것"이라며 "주주에게 배당하지 못하는 기업은 기업의 기본적인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현대그룹을 전문경영인을 중심으로 깨끗하게 운영되고 주주에게 배당이 이루어지는 건실한 기업으로 키우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상속포기를 종용했다', `상(喪)중에 주식을 몰래 사들였다'는 김문희 여사의 주장을 `묘략에 가까운 근거없는 일방적 주장', `도덕성 흠집내기'로 표현, 도덕성 논란의 화살을 김씨에게 넘기기도 했다.
◆엇갈리는 주장..누구 말이 맞나 = 정명예회장은 이날 발표문을 통해 "현대엘리베이터 주식매입은 영결식 당일 장례식장에서 적대적 M&A를 우려한 현대그룹 최고경영진의 다급한 요청으로 시작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여사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정명예회장의 엘리베이터 지분 매입은 전적으로 자발적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정명예회장은 우리쪽에 자사주를내놓으라고 강요했는데 M&A방어 차원이라면 왜 유사시에 의결권이 있는 지분으로 돌릴 수 있는 자사주를 내놓으라고 했겠느냐"고 반박했다.
김여사는 이어 "처음에는 설혹 M&A 방어 의도가 있었을 지 모르지만 경영권 위협이 사라진 뒤에도 대량 매집을 한 것을 보면 누구나 경영권을 뺏기 위한 것이라는것을 알 수 있다"고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정명예회장이 "유족들을 위해 상속포기 권유를 한 것인데 김씨가 진의를 왜곡한다"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김여사는 "정명예회장한테는 상속을 하라 마라할 권한이 없다"고 일축했다.
김여사는 이어 정명예회장이 "유가족들을 위해 건실한 기업을 배려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 "자기 뜻에 동의하지 않으면 `엘리베이터도 못한다'고 정명예회장이 말한 것은 기억난다"면서 "대주주도 아니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나"고 지적했다.
◆양측 `치킨게임' 치닫나 = 이처럼 양쪽의 갈등이 노골화되면서 정명예회장과현회장측간의 `극적 화해'는 사실상 기대하기 힘들어졌다.
실제로 현회장은 20일 기자회견에서 `정명예회장은 훌륭한 사업가로, 여전히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며 앞으로도 상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지만 이미 KCC측이 현회장의 유상증자 방침에 대해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 `선전포고'를 함으로써 양측은 서로 칼을 겨눠야 하는 상황이 됐다.
정명예회장은 이날 글에서 김여사의 주장에 대해 `근거없는 일방적 주장', `모략', `도덕성 흠집내기'라는 표현을 주저하지 않았고 김여사도 이에 대해 `더 이상(정 명예회장과) 상대하고 싶지 않다', `국민들이 누가 옳은지 잘 판단해 줄 것으로믿는다'는 대답으로 응수했다.
일각에서는 서로 마주보며 `치킨게임'을 벌이고 있는 듯한 양측의 경영권 다툼이 결국 기업을 `주주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사적 소유물'로 여기는 전형적인 `오너의 전횡'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이정진기자 hanksong@yonhapne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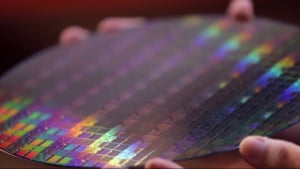
!["이 정도 일 줄 몰랐다"…모처럼 '활짝' 웃은 기재부 공무원들 [관가 포커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404/01.36523223.3.jpg)












![살인과 고문조차 서슴치 않았던 폐륜의 과학자와 의사들 [서평]](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01.36520524.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