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3 14:34
수정2006.04.03 14:35
이정재 금융감독위원장이 지난 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정부가 추진해온 기업 및 금융개혁 정책과 관련,"기업금융을 과도하게 축소시킴으로써 성장잠재력을 약화시켰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23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5년간 기업금융이 늘어나지 않은 게 (현 시점에서) 우리 경제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과거 청산에 너무 매달려 미래를 내다보는 일을 못했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기업이 투자를 해야 성장동인을 유지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과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기존 기업 및 금융회사에 대한 재무건전성 규제정책이 전반적으로 재검토될 것인지 주목된다.
◆ 성장잠재력에 대한 위기 의식
이 위원장은 기업ㆍ금융개혁이 지금까지 부채를 줄이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경제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측면이 많아졌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총유동성(M3잔액)은 97년 말 7백조원에서 2002년 말 1천1백55조원으로 65%나 증가했는데도 이 기간 기업의 금융부채는 불과 4.7% 증가(6백41조원→6백71조원)하는데 그쳤다.
또 금융권의 자산운용 내역을 살펴보면 가계대출 비중은 97년 말 12%에서 지난해 말 38%로 세 배 넘게 증가했지만 기업대출은 38%에서 29%로 뒷걸음질쳤다.
◆ 정부 정책기조 바뀔까
그러나 현 정부 역시 전임 정부와 마찬가지로 재벌의 지배구조 등을 겨냥한 '시장개혁' 의지를 거두지 않고 있어 획기적인 정책 전환은 기대하기 힘들다는 관측이 많다.
이 위원장은 이런 사정을 의식해서인지 "하루 아침에 큰 성과가 없더라도 소관 업무(금융감독)에서부터 기업금융을 저해하는 요인을 찾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범정부 차원의 정책조율을 거친 발언이 아니라는 점을 시인한 것이다.
정문건 삼성경제연구소 전무는 "지금까지 이런 얘기를 하면 '반개혁적'으로 몰리기 일쑤였다"며 "정부 내에서 이같은 의견이 제기된 것 자체가 의미있다"고 말했다.
그는 "외환위기 이후 금융회사가 기업의 과잉투자를 견제하지 못한데 대한 원죄론이 제기되면서 과도한 건전성 규제가 도입됐고 이것이 기업금융 마비를 불러왔다"며 "이 위원장의 말처럼 지금까지 도입한 제도를 원점에서 점검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 기업금융 활성화를 위한 방안
이 위원장은 "금감원 스스로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 기업금융을 저해하는 제도와 관행 등을 찾아보고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이후 도입된 선진 제도들도 5년이 된 만큼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평가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 차원에서 지난 5년간 잇따라 도입된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대손충당금 적립기준과 같은 금융사 건전성 규제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체 회의에서 성장잠재력에 대한 논의가 몇 차례 있었다"며 "앞으로 글로벌 스탠더드(Global Standard) 이름으로 체계적인 검토 없이 도입된 제도들은 재점검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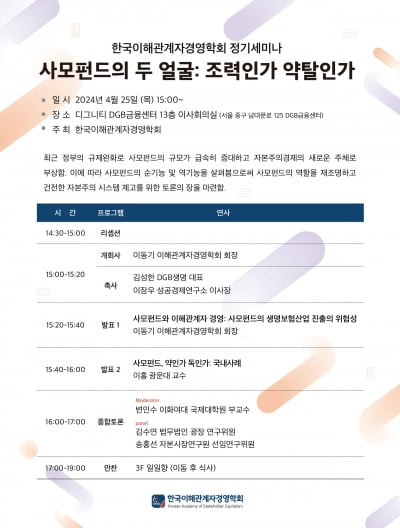

![판매량 줄어도 매출 늘어난 현대차…"비싼차 많이 팔았다" [종합]](https://img.hankyung.com/photo/202404/02.33262402.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