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3 09:52
수정2006.04.03 09:54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지난 87년 도입됐다.
소위 '문어발식 확장', 즉 부문별한 비관련 사업으로의 다각화를 막는다는 취지였다.
그동안 10차례 개정됐다.
87년 도입 당시엔 30대 그룹 소속 계열사의 경우 순자산(자본총액에서 계열사 출자분을 제외한 금액)의 40%를 초과하는 금액은 타회사에 출자할 수 없도록 했다.
95년 4월말에는 출자총액한도 비율을 25%로 강화했다.
그러나 외환위기 직후인 98년 2월 정부는 이를 전격 폐지했다.
외환위기 직후 적대적 인수.합병(M&A)을 허용함에 따라 대기업들의 경영권 방어를 돕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99년말에는 이 제도를 전격적으로 되살렸다.
공정위는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없애자 대기업 총수가 적은 지분으로 다수 계열사를 지배하는 구조가 심화돼 출자제한조치를 부활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경련 관계자는 "99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대기업 구조조정의 '5+3 원칙'을 재강조함에 따라 공정위 정책방향이 갑자기 바뀌었다"고 기억했다.
지난해 4월에는 시행령을 개정해 출자총액제한대상 기업집단을 자산규모 5조원 이상 기업집단으로 줄였고 정보통신, 생명공학, 대체에너지, 환경산업, 신기술 등에 대한 출자를 예외로 인정하는 등 예외인정 범위를 확대했다.
권영설 경영전문기자 yskwon@hankyung.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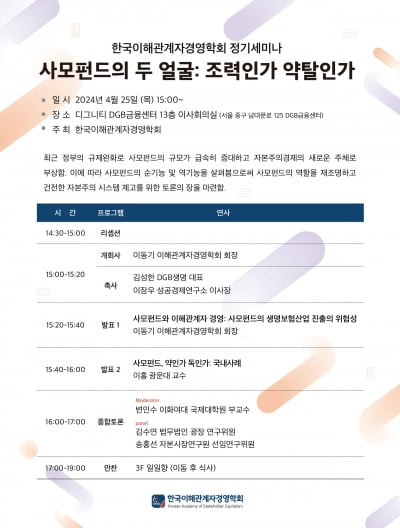











![[신간] 당뇨·심장병·암·치매 예방하기…'질병 해방'](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ZK.36525180.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