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17:45
수정2006.04.02 17:48
한.중 마늘분쟁은 지난 99년 9월 농협중앙회가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KTC)에 중국산 마늘의 수입 급증에 따른 산업피해 구제신청을 한 것이 발단이다.
그로부터 3개월 뒤 재정경제부는 KTC의 건의를 받아들여 2000년 6월 초까지 중국산 마늘에 대한 잠정 세이프가드를 발동했다.
그러나 2000년에 접어들면서 농민단체와 정치권은 이에 그치지 않고 잠정 조치를 정식 세이프가드로 전환하라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특히 4월 총선을 앞둔 농촌 출신 국회의원들은 정부 관계자들을 국회로 불러내 불호령을 내렸다.
정치권의 압력에 굴복한 정부는 6월 초 세이프가드를 2003년 5월까지 발동키로 최종 결정했다.
며칠 뒤 중국이 즉각 반격해 왔다.
한국의 대중국 전략 수출상품이던 휴대폰 폴리에틸렌 등 2개 품목의 수입을 잠정 중단한 것.
깜짝 놀란 한국 정부는 즉시 협상대표단을 중국 베이징에 급파했다.
대표단은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 중단을 풀기 위해 중국 정부의 굴욕적인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결국 그해 7월 양국 통상장관은 기존의 세이프가드 종료시한을 2002년 말까지로 단축하고 이 기간 동안 중국산 마늘을 3만2천∼3만5천t 사준다는 내용의 합의문에 서명했다.
한국 정부가 정식 세이프가드를 발동한지 겨우 한 달여 만에 '항복'한 셈이었다.
이때 서명한 합의문 부속서에 '2003년부터 한국 민간기업이 중국산 냉동.초산 마늘을 자유롭게 수입할 수 있다'는 문구를 삽입, 국내 마늘농가가 피해구제(세이프가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원천적으로 막아버렸다.
정한영 기자 chy@hankyung.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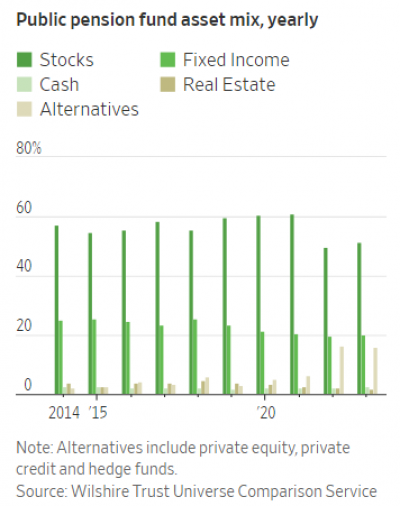




![넷플릭스, 가입자 순증 꺾였다…악재 쏟아진 기술주 [글로벌마켓 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B20240419072033320.jpg)








![스포츠 경기 베팅에서 36년 연속으로 돈을 번 사나이 [서평]](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01.36471018.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