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16:23
수정2006.04.02 16:29
일본에서 내년 4월로 예정된 전면적인 예금부분보장제(payoff) 도입을 앞두고 벌써부터 연기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일본 정부는 예금전액보장제를 시차를 두고 2단계로 나누어 폐지한다는 방침 아래 우선 올 4월 1일 파산은행의 예금주에 대해 정기적금, 정기예금 등 저축성 예.적금의 원금 1천만엔(약 1억원)과 이자만을 제한적으로 보호해 주는 새로운 제도시행에 들어갔다.
이어 다음 단계로 내년 4월 1일부터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보통예금과 당좌예금으로까지 예금부분보장제의 대상을 전면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그러나 최근 일본의 집권여당과 경제계 일각에서 이같은 은행개혁의 시간표에 제동을 거는 목소리가 불거져 나오고 있다.
이유는 "경기회복의 확실한 전망이 보이지 않는데다 주가마저 하락하는 마당에 예금부분보장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할 경우, 경영기반이 약한 신용금고와 지방은행 등으로부터 일거에 예금이 빠져나가 금융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올들어 시즈오카(靜岡)시에 있는 `주부(中部)은행'이 파산한 직접적인 원인이 예금부분보장제 도입에 따른 자금유출에서 비롯됐다는 점도 경제계의 걱정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청은 일단 예정대로 제도를 시행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경영개선을 위한 금융기관들의 자구노력을 촉구해 나갈 방침이다.
금융청은 만일 제도시행을 연기할 경우에는 예금전액보호제도에 따른 부담이 고스란히 납세자인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점때문에, 아직까지는 제도시행과 관련해 단호한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도쿄=연합뉴스) 고승일특파원 ksi@yonhapnews.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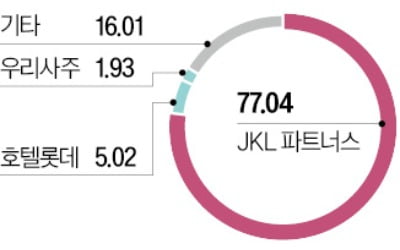












![MBC '뉴스데스크' 앵커 출신 박혜진, 파격 근황 봤더니 [이일내일]](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01.36513659.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