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 논란 가열] '해외에선 어떻게 보나'
앞으로 한국의 경제정책 방향과 구조조정 성과를 알 수 있는 중대한 변수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일단 최근 한국내에서 일고 있는 경기부양 논의에 대해서는 이해가 간다는 시각이다.
3분기 이후 경기가 급랭하고 있고 경제주체들의 심리까지 위축됨에 따라 이대로 방치하다간 일본처럼 장기복합 불황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따라서 금년 상반기에 한국경기가 과도하게 호황을 보였을때 금리인상을 통해 어느 정도 경기를 조절해 놓을 필요가 있었다고 아쉬워한다.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경기부양책을 추진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정책수단이 제한돼 있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한국의 경제구조상 최근처럼 금리와 투자와의 관계가 ''비탄력적''인 상황에서는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기업들의 투자가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다.
민간소비도 최근과 같은 양극화 현상이 해소되지 않는 한 금리인하가 소위 ''있는 계층''의 소비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못한다는 시각이다.
동시에 재정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경기부양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사 재원을 마련해 경기부양책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한국처럼 소규모 개방국가에서는 부양효과가 해외로 누수돼 그 실익이 크게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서둘러 부양책을 썼다가는 자칫 잘못하면 성장률 급락하에 물가만 급등하는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고 있다.
오히려 이럴 때 일수록 구조조정을 통해 경제체질 개선과 성장잠재력을 배양하는 정공법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하고 있다.
만약 이 과정에서 경기가 급랭하는 것이 문제라면 내년 예산에서 연금,의료비과 같은 복지정책의 내용을 일부 수정해 사회간접자본(SOC)에 투자하는 미조정(fine-tuning) 수준에 그쳐야 한다고 목박았다.
유념해야 할 것은 현 시점에서 금리인하와 새로운 정부지출 증대와 같은 총량변수를 건드리는 경기부양책은 ''절대 금물''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한상춘 전문위원 schan@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엘리뇨 가고 라니냐 온다…중미, 곡물 생산 차질 우려 [원자재 포커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404/01.36469281.3.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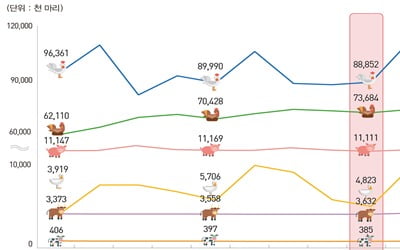



![넷플릭스, 가입자 순증 꺾였다…악재 쏟아진 기술주 [글로벌마켓 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B2024041907203332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