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구조개편] 부채만 32조 .. '개혁 왜 서둘러야 하나'
국회 산업자원위원회는 오는 23일 공청회를 열어 한전 구조개편에 대한 여론을 수렴한뒤 "전력산업 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안)"과 전기사업법 개정 법률(안) 등 두 개 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 여부를 결론짓는다.
입법화에 성공하면 예정대로 구조개편이 진행되지만 실패할 경우 ''공룡 한전''에 대한 수술은 사실상 물건너갈 공산이 크다.
정부는 이들 법안이 지난해 정기국회에서도 논란끝에 심의보류된 적이 있어 올 정기국회 회기내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강박감에 시달리고 있다.
한전 구조개편의 골자는 한전의 발전사업 부문을 우선 원자력 발전을 포함해 6개 자회사로 분할한 뒤에 이중 수.화력분야 자회사 5개를 국내외 투자자에게 단계적으로 매각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한전에 메스를 가하려는 것은 예산만 26조8천억원에 달하는 거대 공기업의 경영 효율성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비효율적인 경영과 비경쟁 사업구조로 원가 절감은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지난해말 전기요금을 5% 올린 한전이 최근 유가 상승을 이유로 다시 가정 및 산업용 요금을 대폭 인상한 것이 좋은 사례다.
여기다 빚이 30조원이 넘는 상태에서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는 신규 발전소 건설이 쉽지 않다는 점도 구조개편의 한 가지 이유다.
정부와 한전은 2015년까지 모두 1백6기의 발전설비를 추가로 건설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발전용량을 현재 4천7백만㎾에서 9천2백만㎾로 늘리기 위한 것이다.
사업비는 무려 67조원에 이른다.
매년 2조원을 조금 넘는 한전의 영업이익으로는 발전소 건설은 커녕 빚을 갚기에도 부족하다.
한전의 대주주인 정부가 계속 증자를 해주는 방법이 있지만 정부 역시 재정적자에 허덕이고 있어 기대하기 어렵다.
결국 한전은 미래 사업을 위한 투자재원조차 만들지 못하는 기형적 구조의 기업이라는 얘기다.
비효율적인 조직 관리도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공기업 체질이 굳어지다보니 내부 경영혁신에 소홀했다는 점은 한전 스스로도 인정하는 사실이다.
한전 사장은 정치권이나 정부 퇴직관료 가운데 실력자들이 낙하산을 타고 거쳐가는 자리가 됐다.
원천적으로 경영 혁신을 꾀하기 어려운 구조다.
한국전력기술 한전산업개발 등 자회사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3만5천여 직원에 대한 조직관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각종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구조개편의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구조개편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한전 노조는 전력산업이 해외의 초국적 독점자본이나 재벌에 매각되면 전력요금이 크게 오르고 국부가 해외로 유출될 것이라며 법안의 국회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17일 파업찬반 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희범 산자부 자원정책실장은 "한전의 경영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다른 대안은 없다"며 "대외적으로 한전 구조개편을 천명한 이상 국가신인도를 고려해서라도 입법화 작업을 더이상 늦추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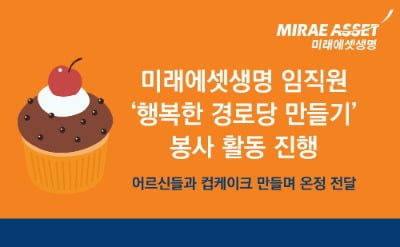







![[단독]하이브 키운 '멀티 레이블'이 제 발등 찍었다](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02.33877838.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