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 리포트-지구 온난화 방지] 내달 기후변화협약 회의..세계가 촉각
기후변화협약은 21세기 지구촌 경제질서를 뒤바꿀 거대한 폭풍.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이 국제 협약은 각국이 이산화탄소(CO2) 등 온실가스 배출량을 자율 감축토록 규정하고 있어 산업계 전반의 우려가 만만치 않다.
지구촌 온난화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는만큼 온난화의 원인이 되는 석유 석탄 등 화석연료 사용을 획기적으로 줄여가자는게 이 협약의 골자다.
이에 따라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등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경제 전반에 걸쳐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협약 이행이 모든 국가에 의무화될 경우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기존 산업분야는 그만큼 설 자리가 좁아질 수 밖에 없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내 선진 회원국 등은 이미 3년전에 2008~2012년의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배출량보다 평균 5.2%씩 감축한다는 목표를 설정해놓았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석유와 석탄 등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20년전 수준으로 되돌려 놓겠다는 것이다.
화석연료를 포함한 에너지 소비 증가율이 매년 10%에 육박하는 한국 경제가 받게될 충격이 어느정도일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11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기후변화협약 6차 당사국 총회에서는 선진국들의 이같은 감축 목표를 담은 "교토의정서"가 구속력을 갖춘 국제협약으로 발효될 수 있도록 하기위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동시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도 토의된다.
한국을 포함한 개발도상국들에 대해서도 강제 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압력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약점인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가 위기상황에 놓인 셈이다.
다행스런 것은 미국 상원이 중국 등 개발도상국이 동참하지 않는 한 교토의정서를 정식 비준하지 않겠다고 결의한 점.
따라서 한국도 한숨은 돌릴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대다수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하다"는 데 원칙적인 합의를 이룬 상황인데다 각국의 입장차이를 좁히기 위한 실무작업이 추진되고 있다.
무턱대고 상황을 낙관하고 있어선 곤란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실제로 유럽연합(EU)은 자동차 연비규제를 강화하며 온실가스 감축을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활용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자동차업계와 EU는 수출 자동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현재 2백g/km 수준에서 2009년까지 1백40g/km로 감축할 것을 합의한 상태다.
세계반도체협회도 자발적인 협약을 통해 과불화탄소(PFCs) 소비량을 2010년까지 95년 소비량 기준으로 10%이상 감축키로 합의해놓고 있다.
벌써 주력 수출산업분야에서 선진국들의 환경규제가 발등의 불이 되고 있다는 얘기다.
규제범위가 점차 넓어질 것이란 추측도 어렵지 않다.
정부와 산업계가 힘을 합쳐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정부는 국제회의에서 일찌기 산업화를 이룬 선진국과 산업화 과정에 있는 개발도상국이 온실가스 감축에서 똑같은 의무를 부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19세기 후반부터 시작된 산업화 과정에서 엄청난 온실가스를 배출한 선진국과 같은 강도의 의무부담을 개도국에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논리다.
중국 등이 이같은 입장에 공동 보조를 취하며 선진국의 압력에 맞서고 있다.
그러나 내부적인 준비를 게을리 할 수는 없다.
정부는 화석에너지 의존도를 낮춰가면서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체질을 만들 수 있는 정책을 꾸준히 펴 나간다는 구상이다.
고정식 산업자원부 자원정책과장은 "현 시점에서 선진국처럼 10~20년 앞을 내다보고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대외적으로 약속하기는 어렵다는 게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면서도 "자율적인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펼쳐 명분을 쌓아가면서 구속력있는 의무부담 시기는 최대한 늦추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동시에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체질을 만들어가기 위한 정부와 업계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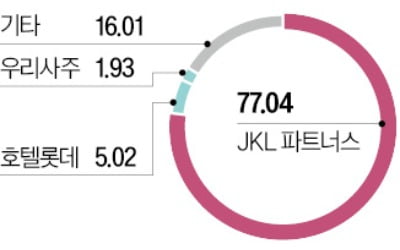












![MBC '뉴스데스크' 앵커 출신 박혜진, 파격 근황 봤더니 [이일내일]](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01.36513659.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