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코너] 對日 수출과 끝마무리
한국에서 가공식품을 들여다 팔고 있는 그는 수입품의 불량포장 문제를 해결하느라 발이 닳도록 이리저리 뛰어 다녀야 했다.
D사는 일본의 대형 종합상사인 M사와 손잡고 조미김을 수출, 11월부터 일본 전역의 편의점에 깔 예정이었다.
난공불락처럼 여겨졌던 편의점을 뚫고 들어가게 된것이다.
더욱이 자사 브랜드 수출방식이어서 회사 인지도도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그러나 40피트짜리 한 컨테이너분의 첫 물량이 일본에 도착하기 직전 샘플을 받아본 K씨는 눈앞이 캄캄해졌다.
포장 뒷면의 상품 바코드가 거래선 편의점의 스캐너에서 판독이 안됐기 때문이었다.
"생각해 보십시오.모든 상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게 바코드 하나로 체크되는 세상인데 우리 상품만 바코드가 안 읽혀진다면 이게 무슨 웃음거립니까? 더구나 처음 납품되는 상품인데…"
바코드 판독이 안된 이유는 포장지의 인쇄 잘못때문임을 안 그는 부랴부랴 서울본사에 사정을 알렸다.
그러자 통관을 중지하고 물건을 돌려 보내라는 지시가 날아 왔다.
하지만 일본세관에선 이미 통관이 끝난 상태였다.
K씨는 입술이 바싹 타 들어갔다.
반품한다 해도 납기를 맞추지 못해 문제가 생기긴 마찬가지였다.
그는 고민끝에 바코드를 도쿄에서 인쇄하기로 했다.
그리고 어렵게 거래선의 요구대로 납품하는데 성공했다.
그렇지만 수입된 수만 봉지의 조미김 하나하나에 바코드를 일일이 다시 붙여야 했다.
D사가 들여온 조미김의 금액은 약 3백만엔(3천만원).결코 큰 액수는 아니었다.
그러나 이 회사는 일본 거래선과 수십년 관계를 맺어온 처지였다.
조미김은 양측 고위층의 신뢰와 교분을 바탕으로 어렵게 수출품목에 오른 상품이었다.
"대일(對日) 비즈니스의 기본은 신용입니다.
사소한 부주의 하나가 수십년 친분과 이미지에 먹칠을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일본소비자들이 얼마나 깐깐합니까?" 일본시장 뚫기가 얼마나 힘든지를 안다면 생산현장에서도 이젠 끝마무리가 안된 상품은 사라져야 한다는 게 그의 호소였다.
도쿄=양승득 특파원 yangsd@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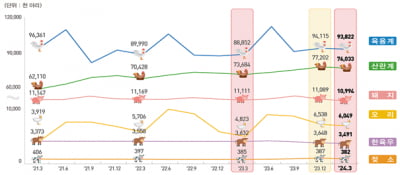




![넷플릭스, 가입자 순증 꺾였다…악재 쏟아진 기술주 [글로벌마켓 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B2024041907203332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