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여록] 금융구조조정의 허와 실
이는 미국의 지방은행인 보스턴은행 다음인 세계 1백12위 수준에 불과하다.
세계 50위권 안에 들려면 자산 랭킹 1~3위인 국민 한빛 주택은행을 다
합쳐야 한다.
국제경쟁력을 갖춘 세계 50위권의 선도은행(리딩뱅크)을 만들겠다는 정부
구상이 얼마나 요원한 얘기인지 알 수 있다.
국내 16개 일반은행의 자산을 다 합치면 5백30조원이다.
이는 세계 1위(1998년 기준)인 일본 도쿄미쓰비시은행(7백85조원)의 3분의2
수준에 불과하고 5위인 영국 홍콩상하이은행(5백68조원)에도 훨씬 못미친다.
이것이 우리 금융산업의 현주소이다.
상업은행과 한일은행이 합병돼 탄생한 한빛은행을 보자.
합병 전인 1998년말 두 은행의 총자산은 89조4천억원이었다.
1년여 뒤 한빛은행의 자산은 80조원으로 줄었다.
정부가 합병 당시 기대했던 리딩뱅크의 모습은 간데 없고 덩치가 커진만큼
운신하기 어려운 공룡만 남았다.
게다가 해외로 팔려나간 제일은행이 안고 있던 짐(대우계열사 워크아웃)마저
억지로 떠안았다.
서울은행은 어떤가.
정부는 외환위기 뒤 3년째 해외매각, 위탁경영, 외국인행장 공모 등 있는
수단은 다 써봤다.
하나도 이룬 게 없다.
자산규모는 3년 전만해도 한미은행의 3배인 33조원에 달했다.
지금은 거꾸로 한미은행에 3조원이 모자란 26조원에 불과하다.
"차라리 미리 손쓸 걸..."하고 뒤늦게 후회하는 정부 당국자들이 많다.
랭킹 1위인 국민은행은 소매금융 전문은행이어서 살아남았다는 점을
빼놓고는 다른 은행과 다를 바가 없다.
변화에 적절히 대처했다기보다는 그냥 있다보니까 국내 최대가 된 것이다.
행장선임 과정에서 외부인사를 기피하는 분위기도 따지고 보면 변화를
기피하는 것에 다름아니다.
금융구조조정은 지난 2년간 김대중 정부의 최대치적으로 꼽힌다.
은행을 문닫고 합병시키고 한 것이 과거 정권에선 상상도 못했던 일이기도
하다.
그러나 금융회사의 간판을 바꿔단 것 외엔 금융구조조정에서 무언가
이뤘다고 장담할 만한 게 무엇이 있는지 반문하고 싶다.
은행들 주가가 왜 주택은행 주가의 10분의1 수준에 불과한지를 곰곰히 따져
볼 때다.
정부 스스로 금융구조조정이 이미 완료된 업적이 아니라 진행중인 과제임을
깨달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시장에 의한 2차 금융구조조정도 같은 결과를 낳을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공적자금 64조원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니다.
< 오형규 경제부 기자 ohk@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3월 7일자 ).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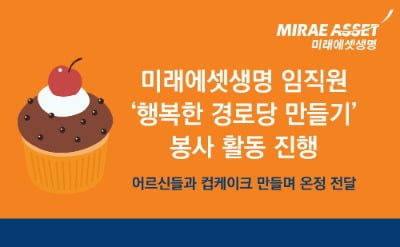







![[단독]하이브 키운 '멀티 레이블'이 제 발등 찍었다](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02.33877838.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