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도 문화다...21C 전략] (상) 제품에 문화의 옷 입히자
토니 블레어 영국총리가 지난 97년 집권직후 멋진 국가건설을 위해 던진
화두다.
노쇠한 영국을 젊은 혈기와 창의력이 가득한 미래의 땅으로 바꿔 놓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블레어 총리는 쿨 브리타니아의 선봉으로 디자인산업 육성을 내걸었다.
영국을 아예 "세계의 디자인공장"으로 만들겠다는 야심을 내비쳤다.
블레어 총리의 승부수는 21세기 국가 및 상품경쟁의 우열을 가늠할 "문화"의
역할을 강조한 것이란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디자인은 단순한 포장수단에 머무르지 않는다.
꿈과 환상을 아우르는 이미지 창조의 토대다.
상품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핵심요소 중의 하나다.
그 뿌리는 문화란 토양에 내리고 있다.
결국 디자인 자체가 아니라 문화의 숨결을 앞세운 도약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다.
새 밀레니엄시대의 경쟁은 그 문화의 색깔에서 결정된다.
이미지가 구매를 결정하는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상품자체의 이미지에 국가의 이미지까지 가세하면 탄력은 더해진다.
기능과 성능의 위력은 점차 빛을 잃어가고 있다.
발빠른 기술교류와 개발경쟁으로 상품의 기능과 성능의 격차는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소비자들은 대신 상품에 어린 특정 이미지를 쫓는다.
자신들이 선호하는 문화를 찾고 즐기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맥도널드에 갈 때는 고기맛이 좋아서 때문만은 아니다. 맥도널드 햄버거에
담겨있는 미국이란 나라의 이미지나 느낌을 소비하기 위해서다"(기 소르망
파리 정치대학원 교수)
상품에 문화의 옷을 입히는 일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언급이다.
문화를 어떻게 소비자들의 구미에 맞게 가미하느냐에 따라 소비자들의
상품충성도가 좌우되기 때문이다.
상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믿음은 국가이미지에도 영향을 끼친다.
물론 상품엔 어느정도의 문화가 스며있다.
소비자들이 좋아하거나 싫어하고 또는 무관심해 하는 정도의 차이일 뿐이다.
문제는 소비자들을 자국문화에 맛들이게 하는 방법에 있다.
선진국들은 새 밀레니엄의 경쟁을 헤쳐나가기 위해 자국문화의 계발과
이미지제고를 키워드로 삼고 있다.
토니 블레어의 영국은 "디자인공장"을 외치며 국가이미지 쇄신에 나섰다.
독일은 "메이드 인 저머니"(Made in Germany )대신 "저먼 디자인"(German
Design)을 각인시키며 자국상품 이미지를 차별화하고 있다.
19세기의 영토싸움에서 20세기의 무역전쟁을 거쳐 "21세기는 문화의 격전장"
이 될 것이란 판단이 밑바탕에 깔려있다.
앞으로 문화가 상품시장을 보장하고 나아가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얘기다.
"상품에 감동과 문화적 부가가치를 첨가하지 않으면 상품구실을 못하게 되는
세상이 오고 있다"(이어령 새천년준비위원장)
우리나라의 경우 문화가 구매의 요인이 되는 상품이 뚜렷이 떠오르지 않는
실정이다.
가격경쟁력에 치중한 외형성장에 주력해 얼굴없는 상품만을 양산해온
탓이다.
독자적 기술개발을 통한 혁신제품도 마땅한 게 없다.
좁은 의미의 문화상품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다.
국가이미지도 마찬가지다.
중국의 변방 또는 일본의 아류란 인식이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다.
상품에 향유하고 싶은 문화를 아로새기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이유다.
이젠 제품이 아니라 의미를 팔고 이미지를 수출한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그 출발점은 물론 문화에 있다.
< 김재일 기자 kjil@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8일자 ).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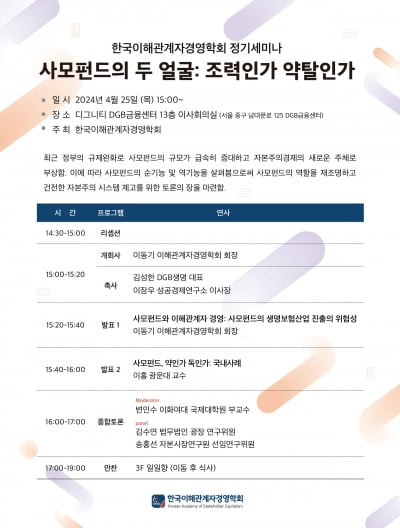

![판매량 줄어도 매출 늘어난 현대차…"비싼차 많이 팔았다" [종합]](https://img.hankyung.com/photo/202404/02.33262402.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