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여록] 메아리뿐인 개혁
기획예산위원회 관계자의 푸념섞인 고백이다.
그가 공공개혁의 기치를 내걸고 기획위에 합류한지 1년만에 개혁이 흔들리는
모습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조직 개편이 그렇다.
46억원의 세금을 쏟아부었지만 부처 이기주의와 정치권의 정략 속에
"용두사미" 개편안을 그려내고 말았다.
뒤이은 부처별 직제개편도 마찬가지.
부처들의 밥그릇 싸움은 예외없이 불협화음을 울려 댔다.
정부조직개편은 시발탄일 뿐이었다.
공직에 민간 경쟁력을 수혈하기 위해 전격 도입키로 한 개방형 임용제도
당초 계획에서 대폭 후퇴됐다.
2001년까지 전국 읍.면.동 사무소를 폐지해 자치센터로 바꾼다던 계획도
총선을 앞둔 정치권의 입김과 기구 및 인원 축소를 반대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압력 앞에 백기를 들었다.
뿐만 아니다.
개혁실적이 부진한 공기업 사장에 대해선 임면권자에게 해임 건의안을
올린다는 정부 방침도 유야무야 돼가는 분위기다.
한쪽에선 그동안 수술했던 부위가 다시 곪아터지고 있다.
공기업의 눈가리고 아웅식 개혁은 연일 언론의 포화를 맞고 있다.
그동안 숨죽였던 공무원 조직도 "뭉치면 산다"는 진리를 확인하곤 전열을
재정비중이다.
고질적인 관료병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은 이처럼 정치권의 태만과 정부의
방황속에서 방향을 잃어가는 모습이다.
기획위 내부에서조차 "공공개혁은 대통령 취임뒤 1년안에 해치웠어야 했다"
는 반성의 소리가 나온다.
"공공개혁은 영국과 뉴질랜드와 같은 정치 선진국에서나 가능한 일"이란
자조적인 얘기까지 들린다.
1년전 긴장과 각오로 기획위에 합류했던 개혁 투사들의 패기마저 이처럼
쇠잔해가고 있다.
저효율의 정부, 방만한 공기업, 불투명한 세제와 세정, 갈등과 부실의
지방자치, 관료병 가운데 하나도 완치된게 없는데도 말이다.
그 사이에 "혹시나" 했던 국민들의 기대감은 "역시나"하는 실망감으로
바뀌고 있다.
국민의 정부 집권 2년째인 지금 공공부문 개혁은 국민들의 지지를 얻지
못한 채 "그들만의 개혁"이 돼가고 있다.
고통을 분담하자던 정부의 구호가 이제 공허한 메아리가 돼 버린 느낌이
드는 건 지나친걸까.
< 유병연 경제부 기자 yooby@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10일자 ).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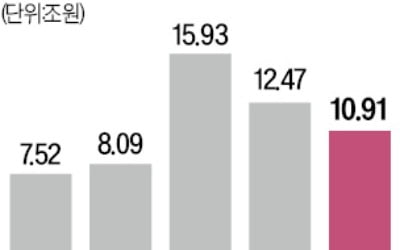










![[오늘의 arte] 예술인 QUIZ : 단편 '일러두기'로 이상문학상 수상](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AA.36512057.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