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여록] 알아서 긴 정부
순수한 소비절약 켐페인일 뿐 수입을 억제하는 어떤 압력도 없었으며 그럴
의사도 없다고 거듭거듭 강조하더니 느닷없이 백기를 들었다.
하기야 요즘 세상에 수입품이라는 이유로 통관을 저지한다든지 수입업자만
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이는 것은 말도 아니다.
국산품을 애용하자고 외치는 것도 넌센스다.
만일 민간 차원이 아니라 관청이나 당국이 이런일을 한다면 누구든
말리는게 당연하다.
한데 마치 죽을 죄라도 지었다는 듯 정부가 경제장관회까지 벌이며 "수입품
차별 방지"를 천명하고 나선 것은 아무리 뜯어봐도 꼴사나왔다는게 중론이다.
뒤집어 보면 실제로 한국정부가 수입억제 조치를 취해 왔다는 것을 간접적
으로 시인하는 결과가 되고 말았기 때문이다.
심하게 말하면 매가 무서워 않한 것조차 했다고 시인한 꼴이다.
실제로 사치성 수입품을 쓰지 말아야 하고 해외 보신관광을 단속해야
한다고 외친 것은 정부가 아니라 언론과 시민단체였다.
요즘같이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언론과 시민단체가 자발적으로 애국운동을
벌인다면 기특한 일이다.
굳이 정부가 나설일도 아니려니와 "그런일을 해서는 안된다"고 일부러 말릴
까닭도 없다.
"많은 나라들이 한국의 근겁절약 운동을 소비재수입 배격운동으로 오인하고
있으며 미국과 EU(유럽연합)가 한국을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겠다고
벼르고 있어 이같은 행사를 가졌다"는게 재정경제원의 설명이다.
한마디로 성의표시를 해야 다치지 않는다는 얘기다.
알아서 길테니 잘 봐달라는 것이다.
공연한 통상마찰을 막자는 취지는 이해가 가지만 지금 우리 처지가 대국
에게 이쁘게 보일 궁리나 할만큼 한가하냐는게 경제계의 지적이다.
오히려 투쟁을 해서라도 적자를 줄이고 소비생활을 건전하게 돌리는게
정부가 해야할 일 이라는게 알만한 사람들의 지적이다.
소비절약 운동의 정당성과 적법성을 놓고 선진국들과 맞붙어 설득을 해
시원찮을 판에 알아서 기는 정부에 믿음이 갈리 없다는데 할말이 없게 됐다.
김성택 < 경제부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10일자).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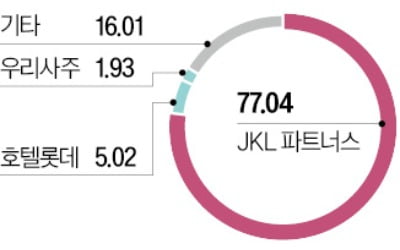












![MBC '뉴스데스크' 앵커 출신 박혜진, 파격 근황 봤더니 [이일내일]](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01.36513659.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