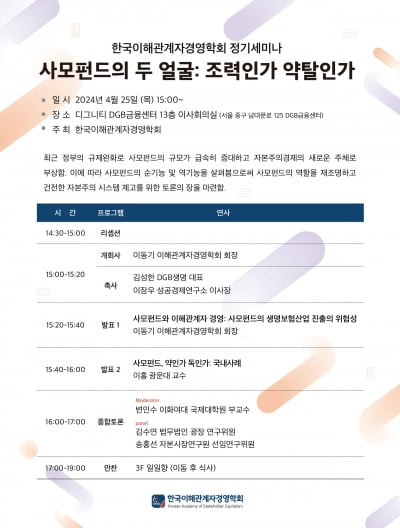[세법개정안] 개혁부담완화명분 '현실과 타협'..의미/문제점
작년에 세법을 개정하면서 내년부터 시행할 금융소득종합과세제를 미리
만들어 두었고소득세및 상속.증여세의 세율도 모두 낮추어 놓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올 세제개편안엔 세율을 바꾸는 등의 눈에 띄는 변화는 거의
없으며 실무적인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다만 실무적인 제도개선 내용의 초점을 금융실명제와 금융소득종합과세등
개혁과제들을 뒷받침하는 데 맞추고 있다는 게 특징이다.
실명제로 부담이 커진 부문에 부담을 덜어주거나 피해 갈수 있는 창구를
새로 만들어 주었다는 것이다.
과표 양성화로 중소사업자들의 세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에따라 부가가치세
면세자와 과세특례자 대상을 크게 늘리고 중소사업자에 대한 간이과세제를
도입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저율로 분리과세하는 가계생활저축을 신설하고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원천
징수세율을 인하한 것은 금융소득종합과세제의 충격을 줄이기 위한
보완책이다.
금융기관이 국세청에 내는 금융소득 자료의 제출횟수를 줄이고 공사채형
수익증권의 매매차익은 과세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한것도 같은 맥락이다.
개혁조치들이 세부담을 무겁게 하고 충격을 줄수 있다는 측면에서 부담을
다소라도 덜어줄 필요가 있다는 게 정치권과 당국의 시각이었다.
하지만 이같이 세부담을 완화하는 과정이 정치권에 의해 주도됨으로써
조세논리는 왜곡되고 말았다는 게 조세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새로 도입하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는 조세징수체계를 신고납부 체제로
바꾼다는 본래의 방향과는 정면으로 상치되는 제도다.
납세자들이 세금계산서를 충실히 갖추어 성실하게 신고하게 해야 하는
게 바람직한 방향인데도 간이과세제는 세금계산서를 내지않아도 세무당국이
"알아서" 매입세액을 공제하게 해놓았다.
세금계산서를 챙겨놓지 않아도 되도록 제도화 해준 셈이다.
부가가치세 면세점을 올려 나가면서 과세특례제도는 폐지하겠다던 방침도
이번에 면세자와 과특대상을 늘려놓는 "편안한" 방식으로 타협됐다.
정치적인 압력 때문에 어쩔수 없었다 치더라도 대기업엔 오히려 부담을
늘려놓아 "원칙"마저 일관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다.
금융실명제로 비자금을 조성하기 어렵게 된게 주지의 사실인데도 대기업의
접대비 한도는 "부조리"를 명분으로 대폭 축소시켜 놓은 대목을 들수 있다.
특히 정부가 기업의 국제경쟁력강화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있고 작년
올세제개편 때 법인세 최고세율은 인하토록 하겠다고 밝혔으면서도 법인
세율은 내리지 않았다.
세계무역기구(WTO)협정에 따른 금지보조금 협상과 연계해 인하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게 해명이지만 "세수"가 걱정돼 세율인하시기를 미루었다고
볼수 밖에 없다.
이밖에 서화.공동품에 대한 양도소득 과세는 실효성도 의문시되는
양도소득세를 매기기로 했다가 종합소득세로 바구었지만 거래명세서도
받지않고 신고에의존하게 함으로써 역시 이름만 남게 됐다.
"과세"한다는 명분만 살리기 위해 정부 스스로도 효력을 믿지 못하는
제도를 만들고 만 꼴이다.
몇가지 납세자의 편의를 고려한 흔적이 있기는 하지만 부동산을 거래할
때세무서에 미리 양도사실을 신고해야만 등기를 할수 있도록 한 것은
대표적인"징세편의 주의"사례로 지목된다.
지금도 검인계약서를 작성하면 1부가 세무서에 통보되고 있으나 전산
처리에 시간이 걸려 세무관서가 양도사실을 파악하는데 오래 걸리기 때문에
직접 와서 신고하라는 것이다.
전산체제를 확충해야할 일을 납세자에게 떠넘긴 셈이다.
결국 이번 세제개편안은 개혁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 무게를 두어보려고
노력하긴 했으나 미진했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이며 부담완화의 형평성과
일그러진 조세논리를 바로잡는 숙제를 남겨 놓았다고 할 수 있다.
<정만호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일자).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